
[심연희 사모의 가정상담칼럼]
목회자의 자아상
![[심연희 사모의 가정상담칼럼] </br></br> 목회자의 자아상](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17/10/Web_%EC%8B%AC%EC%97%B0%ED%9D%AC%EC%82%AC%EB%AA%A8.jpg?resize=130%2C168&ssl=1)
심연희 사모(RTP 지구촌 교회, Licensed Marriage and Family Therapist)
2년 전 즈음 엄청나게 빠른 성장을 이룬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한 대형교회 목사가 해임되었다. 미국에서도 규모로 치면 다섯 손가락에 꼽히도록 큰 교회의 성장을 주도한 목회자였다. 알코올 남용과 정신적 문제들, 그리고 가정불화가 원인이 되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소신을 대외적으로 강하게 피력하던 또 다른 목사가 동성애자 파트너에 의해 마약 복용 및 동성애의 전력이 폭로되기도 했다. 미성년자와의 성매매가 발각되어 목을 매 자살한 목회자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이든 한국이든 잊을 만하면 교계에서 목회자의 외도나 성추행, 설교 표절 등의 가슴 아픈 소식이 들려오곤 한다. 주위 교회들과 사역자들의 귀감이 되고 선망이 되었던 목회자들의 불명예스러운 사임은 교회와 동역자들에겐 큰 충격과 실망이 된다. 사역하던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폭풍이 된다. 외부에서 기독교를 바라보는 곱지 않은 시선에 더욱 거센 공격과 비아냥의 빌미를 주기도 한다.
그 유혹에서 자신을 지켜내지 못했던 목회자들을 보며 돌을 던지기보다는, 같은 목회자나 사모로서 안타까움과 두려움을 금할 수 없다. 그 유혹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음을, 그 연약함에서 누구도 예외일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들의 분명한 잘못을 단호하게 책망하면서도, 잘못된 선택까지 이끌었던 인간의 약함이 누구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님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신의 잘못된 선택이 가정뿐이 아니라 교회와 교계에 두고두고 부정적 여파를 남길 수 있음을 누구나 다 알지만, 그 함정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태껏 이뤄온 모든 사역과 명예를 단 한 번에 잃을 만한 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지 못할 정도로 약해져 갔던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그 원인이 한두 가지로 간단히 설명될 수는 없다. 그러나 많은 이유 중 한 가지는 목회자에게 쏟아지는 기대와 부담감에서 출발한다. 목사나 사모의 자리는 분명 그 이름만으로 갖는 무게가 있다.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목사가 무언가를 잘못했다는 기사가 신문에 뜨면 당장에 목사라는 사람이 그런 짓을 했다고 더 비난한다. 바람을 핀 남자가 다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목사의 외도는 가정뿐 아니라 사역의 끝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만큼 기대치가 높은 것이다. 목회자나 사모의 자리만으로 이미 도덕적 잣대가 높게 책정되며, 도덕성은 사역의 승패와 직결되어 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이들이 보는 나와 내가 보는 나 자신의 간격이 점점 벌어져간다. 여기서 오는 괴리감이 점점 더 목회자를 조여 오는 것이다. 사람들의 기대를 계속해서 충족시킬 수 없겠다는 두려움이 목회자로서의 자존감을 좀먹어 간다. 그 부담감과 두려움에서 잠시라도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목회자를 외도로, 표절로, 중독으로 이끌기도 한다.
목회자 자녀도 마찬가지다. 한 번도 목사 딸이고 아들이니 똑바로 살아야 한다는 말을 대놓고 한 적이 없어도 아이들은 이미 본능적으로 안다. 교회에 있을 때 자신에게 주어진 기대치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그래서 같은 잘못을 해도 더 많이 혼나거나 비난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목회자 가정은 비밀이 많아 보이기도 한다. 가려야 할 것이 더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목회자라는 타이틀이 그저 평범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꽤나 무거운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 벗어던지고 싶은 부담으로 다가오는 날이 있다. 감당이 안 되는 십자가처럼 짓눌릴 때가 있다.
칼 융의 분석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정신구조를 페르소나, 자아, 그림자라는 개념으로 구분 지어 설명한다. 페르소나는 그리스의 연극에서 배우들이 착용하던 가면을 뜻하는데 ‘외적 인격’, 즉 타인에게 보이는 나의 모습을 말한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모습이고 행동규범이다. 목사, 사모라면 이 정도는 돼야 한다는 기대치이다. 그런데 대외적으로 보이는 그 페르소나 뒤에는 그림자가 존재한다. 우리 안에 있는 부도덕하고, 부정적이고, 가리고 싶은 더러운 면이다. 인간은 누구나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 온전한 인간이 없다는 성경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한다. 당연히 목회자나 사모에게도 이 그림자는 존재한다. 말씀을 들고 강단에 호기 있게 서면서도 사람들의 반응이나 비판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주일의 나와 주중의 내가 다르다. 사람들이 몰라야 하는 허물들이 셀 수도 없다. 자신이 얼마나 쪼잔한지, 찌질한지, 뒤끝이 작렬하는지, 얌체인지, 비겁한지 절대 들킬 수 없다. 하지만 그림자는 잠시 숨길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이유이다. 언제나 은혜만 끼치며 살 수 없고, 맞는 말만 하고 살 수 없다. 안타깝게도 교회에 오는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나 때문에 교회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 남 일을 척척 해결하기는커녕, 나 자신도 감당이 안 되는 문제들로 발버둥 치며 산다. 목회자가 사람인 이유이다.
자신이 가진 페르소나와 그림자의 차이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목회자는 병들어간다. 나를 보는 사람들의 기대와 그 뒤에 숨겨진 실제의 내가 다르다고 느낄수록, 우리는 그것을 감추기 위해 치열한 노력을 한다. 그런데 우리 안에 숨긴 어두운 그림자는 없애려고 애쓸 때 더 짙어진다. 센 척, 거룩한 척, 괜찮은 척하는 벽이 높아질수록 그 벽 뒤로 드리워지는 나만 아는 그림자도 높아진다. 오히려 그 그림자를 인정하고 마주볼 때 우리는 비로소 빛으로 나온다. 내 안에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공존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숙함이다. 자신이 얼마든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 사람임을 인식하는 것은 용기이다. 자신 안에 있는 약함을 미워하고 비관하고 감추기보다는, 그 약함과 화해하는 것이다. 자신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나의 약함을 용서하는 것이다. 자신의 부끄럽고 죄된 모습이 당당해서가 아니다. 이미 받은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약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닮아가는 과정은 나의 부끄러운 그림자,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구원을 시작하신 엄청난 사랑에 기대면서 시작된다. 나의 그림자로 통하는 문을 주님께 열면서 시작된다. 나의 강함이 아닌 주님의 강함에 기대면서, 나의 거룩함이 아닌 주님의 거룩함을 의지하며 시작된다. 그래서 그림자는 빛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 우리의 약함이 축복이 된다.




![[특집 인터뷰] 게이트웨이 신임총장 Dr. Adam Groza](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5/02/Dr-Adam-Groza.webp?resize=150%2C150&ssl=1)





![[박인화.박금님 선교사 부부의 하.우. 남아공 행전] (2) 이제 시작이다](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5/01/Copy-ofCopy-of%EB%B0%95%EC%9D%B8%ED%99%94-%EB%B0%95%EA%B8%88%EB%8B%98-%EB%B6%80%EB%B6%80.jpg?resize=150%2C150&ssl=1)




![[특집] 침례교 목회자, 주목할 신간들 집필 이어져 – 목회 도서 4권](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4/11/%EC%A0%9C%EB%AA%A9-%EC%97%86%EC%9D%8C.jpg?resize=150%2C150&ssl=1)
 “포장을 벗고 진짜가 되자”](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0/08/%EA%B6%81%EC%9D%B8-%EB%AA%A9%EC%82%AC%EB%8B%98-web.png?resize=440%2C264&ssl=1)
![[정태회 목사의 삶, 안목, 리더십] 집요함](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0/08/web-%EC%A0%95%ED%83%9C%ED%9A%8C-%EB%AA%A9%EC%82%AC%EB%8B%98.png?resize=440%2C264&ssl=1)
![[이수관 목사의 목회의 길에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0/08/%EC%9D%B4%EC%88%98%EA%B4%80-%EB%AA%A9%EC%82%AC%EB%8B%98-web.png?resize=150%2C150&ssl=1)
![[박성근 목사의 신앙 & 삶] 시간의 상대성 이론](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0/08/%EB%B0%95%EC%84%B1%EA%B7%BC-web.png?resize=150%2C150&ssl=1)
![[손경일 목사의 세상에서 말씀 찾기] 브라질~~](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1/11/web-%EC%86%90%EA%B2%BD%EC%9D%BC-%EB%AA%A9%EC%82%AC%EB%8B%98.jpg?resize=150%2C150&ssl=1)
![에스더 사모의 [진리와 하나된 교육] – 18 “숨겨진 가르침”](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3/08/%EB%B0%95%EB%AF%BC%ED%9D%AC-%EC%82%AC%EB%AA%A8.jpg?resize=440%2C264&ssl=1)
![[특집 인터뷰] 게이트웨이 신임총장 Dr. Adam Groza](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5/02/Dr-Adam-Groza.webp?resize=250%2C250&ssl=1)
![에스더 사모의 [진리와 하나된 교육] – 17 “Soli Deo Gloria”](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3/08/%EB%B0%95%EB%AF%BC%ED%9D%AC-%EC%82%AC%EB%AA%A8.jpg?resize=150%2C150&ssl=1)




![[강태광 목사의 문학의 숲에서 만나는 진리의 오솔길] C. S. 루이스의 작품 산책(2) 순전한 기독교 ①](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0/08/%EA%B0%95%ED%83%9C%EA%B4%91-web.png?resize=150%2C150&ssl=1)
![[김웅의 성경만화] 성경 배우는 세 집사: 요시야 편](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3/12/%EA%B9%80%EC%9B%85-%EB%AA%A9%EC%82%AC%EB%8B%98-scaled.jpg?resize=150%2C150&ssl=1)
![목회리더십 2025 연례모임 [2025.4.7(월)~9(수), VA]](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5/03/web-mok-re.png?resize=440%2C264&ssl=1)



![[시론 時論] 사랑의 메시지](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3/09/%EC%98%A8%EB%9D%BC%EC%9D%B8%EB%8F%84-%EB%B3%80%EA%B2%BD-Dr-Sam-Lee.jpg?resize=388%2C264&ssl=1)
![[사설 社說] 총회의 미래 전략 위한 데이터가 필요하다](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1/04/%EC%82%AC%EC%84%A4.png?resize=150%2C150&ssl=1)
![[시론 時論] 신년을 맞이하며](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3/09/%EC%98%A8%EB%9D%BC%EC%9D%B8%EB%8F%84-%EB%B3%80%EA%B2%BD-Dr-Sam-Lee.jpg?resize=150%2C150&ssl=1)
![[긴급기도] 최악의 LA 산불 피해 속 남가주지방회장 서종학 목사 “많은 기도 부탁”](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5/01/Screenshot-2025-01-17-080455.png?resize=150%2C150&ssl=1)
![[인터뷰] “하버드생들과 밤새 게임·성경공부”… 부모 마음으로 제자양육](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5/01/%EC%9D%B4%EA%B8%88%ED%95%98%EA%B5%90%EB%AA%A9.jpg?resize=150%2C150&ssl=1)
![[특집] “애벌레가 나비 되듯, 약함이 강함으로” 제11회 전국 사모수양회… 80여 사모 회복과 은혜 체험](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4/12/Resized%EC%82%AC%EB%B3%B8-4568.jpg?resize=150%2C150&ssl=1)






![[다가오는 총회 소개 영상] ③ [인터뷰] 주강사 박성근 목사](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4/05/thum3-re.png?resize=440%2C264&ssl=1)
![[다가오는 총회 소개 영상] ② 정기 총회 장소를 미리 보시죠](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4/05/Slide1-1.jpg?resize=150%2C150&ssl=1)
![[다가오는 총회 소개 영상] ① 총회장 초청·환영 인사](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4/05/R-%EC%8D%B8%EB%84%A4%EC%9D%BC-%EC%B4%9D%ED%9A%8C%EC%9E%A5-%EC%B4%88%EB%8C%80-%EB%B0%8F-%ED%99%98%EC%98%81.jpg?resize=150%2C150&ssl=1)

![[미드웨스턴 신학칼럼-박성진 교수] </BR></BR> 새해 벽두부터 원어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끼며](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18/03/Web_%EB%B0%95%EC%84%B1%EC%A7%84-%ED%95%99%EC%9E%A5.jpg?resize=130%2C169&ssl=1)
![[시론 時論] 장로직에 대한 논쟁을 보면서](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18/03/%EA%B9%80%EC%98%81%ED%95%98.jpg?resize=120%2C163&ssl=1)


![목회리더십 2025 연례모임 [2025.4.7(월)~9(수), VA]](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5/03/web-mok-re.png?resize=150%2C150&ssl=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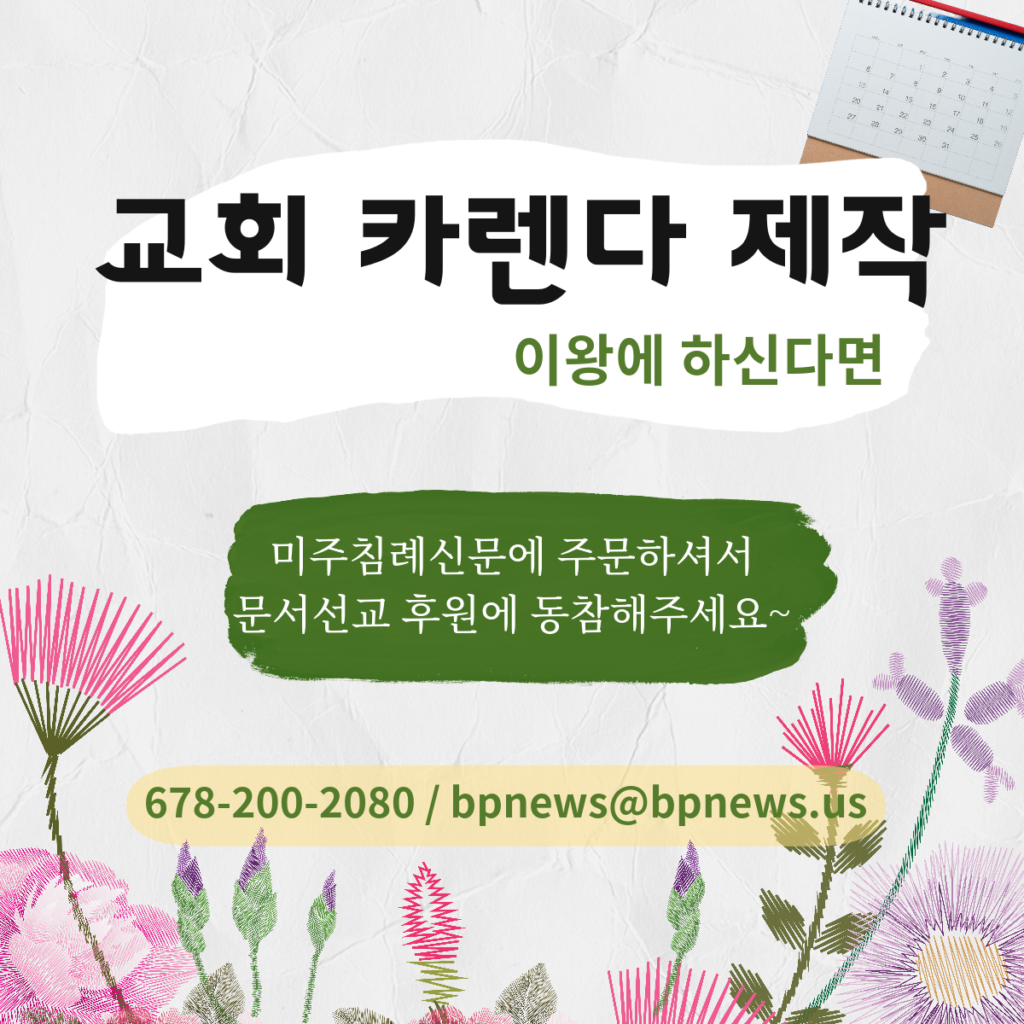

![[특집] “애벌레가 나비 되듯, 약함이 강함으로” 제11회 전국 사모수양회… 80여 사모 회복과 은혜 체험](https://bpnews.us/wp-content/uploads/2024/12/Resized사본-4568-65x65.jpg)
![[특집] 제4회 미주미래목회포럼 성료](https://bpnews.us/wp-content/uploads/2024/12/web-KakaoTalk_20241127_062827557_15-e1734541216798-65x65.jpg)
![[특집] 테네시지방회, 클락스빌 지역에서 ‘비타민, 홍삼보다’ 힘나는 가을모임 개최](https://bpnews.us/wp-content/uploads/2024/10/Screenshot-2024-10-26-194318-65x65.png)
![[특집] “어려운 목회의 길, ‘코칭’이라는 어깨동무 사역으로 함께 간다”](https://bpnews.us/wp-content/uploads/2024/10/코칭단체사진-65x65.png)
![[특집 인터뷰] 게이트웨이 신임총장 Dr. Adam Groza](https://bpnews.us/wp-content/uploads/2025/02/Dr-Adam-Groza-65x65.webp)
![[긴급기도] 최악의 LA 산불 피해 속 남가주지방회장 서종학 목사 “많은 기도 부탁”](https://bpnews.us/wp-content/uploads/2025/01/Screenshot-2025-01-17-080455-65x65.png)
![[인터뷰] “하버드생들과 밤새 게임·성경공부”… 부모 마음으로 제자양육](https://bpnews.us/wp-content/uploads/2025/01/이금하교목-65x6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