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회단상 牧會斷想] 예술을 즐기는 신앙
![[목회단상 牧會斷想] 예술을 즐기는 신앙](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1/12/%EC%A7%80%EC%A4%80%ED%98%B8-%EB%AA%A9%EC%82%AC%EB%8B%98-web2.png?resize=1200%2C640&ssl=1)
 지준호 목사(헌츠빌 은퇴, 자유기고가)
지준호 목사(헌츠빌 은퇴, 자유기고가)
예술을 즐기는 신앙
예술 작품 앞에만 서면 주눅이 들었다. 듣고 보고 읽으며 ‘전공자들만을 위한 예술인가?’ 이해하기 어려워 불평했다. 이러던 한 날 ‘예술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톨스토이의 글에 힘입어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하며 느끼고 깨달은 아름다움과 진리와 선과 악을 나름의 기술로 표현하는 것이 예술”이라 정의를 내린다.
이후로 오묘하고 아름답게 지어진 자연을 예술 작품으로 사랑을 느끼며 즐긴다. 아침저녁으로 연출하는 노을,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구름과 하늘의 조화로운 색깔들, 아무렇게나 피어진 생존력을 가진 길가의 야생화, 풀잎에 맺혔다 사라지는 맑고 고운 이슬방울, 남의 집 담 너머 보이는 정성스레 가꾸어진 꽃들, 눈만 열면 볼 수 있는 널브러진 작품들을 즐긴다. 그리고 그 안에 녹아 숨어 순수하고 겸손하게 찾는 이들에게 드러내는 작가의 지혜를 알아차리는 일은 신앙인들의 특권임이 새롭다.
이뿐이 아니다! 과학과 예술이 조화를 이룬 다양한 건축물과 생활용품들을 통해 인간에게 주어진 능력에 감탄하며 편리함을 누리고, 발견한 진리를 나누고 협력한 인품들에 감사하며 여유가 생긴다. 이러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잉태한 질문과 아픔과 신앙고백으로 그려진 천지창조를 감상하며 시대와 문화를 초월한 작가와 공감을 맛본다.
성전의 건물을 거룩하고, 장엄하게 지어놓고 그에서 나오는 권위로 백성들 위에 군림하며 온갖 혜택을 누리는 이들, 진리에 눈 뜨도록 돕기는커녕 눈멀고 바보 같은 신앙인을 만들고,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신학 용어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만든 설로 ‘이래야 천국 간다. 저래야 축복받는다’ 외치며, 사람들을 이용하는 이들을 보며 이는 질문과 아픔과 신앙고백을 천장에 그리는 미켈란젤로를 상상하며 가슴이 뜨겁다.
육체의 생명은 있으나 영적인 생명이 없는 아담의 모습, 노아의 술 취한 모습으로 인간의 연약함을 호소하고, 생명을 갈구하는 인간과 생명을 주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목마름이 아담과 하나님의 닿을 듯 말 듯 한두 손가락 끝으로 이야기하는 듯하다. 하와를 향한 아담의 시선을 통하여 짝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전하는데, 애타게 전하려는 진리에는 관심 없고 욕심을 채우려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구하는 내 속마음이 드러나 부끄러움이 인다.
질문하고 답 듣기로 진리에 접근할 수 있는데, 질문하는 이들에게 믿음 없다 눈짓하며 하나님과 이간시키는 거룩한 옷과 직위로 포장한 이들. 이런 줄도 모르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같은 것이 어떻게 알겠느냐’ 질문을 포기한 백성들. 그러다 더러는 교회를 떠나고, 더러는 뜨거운 믿음이 있어지려 능력 있다는 이들을 찾아다니고, 더러는 죽어서 갈 천당만 기대하고 이해할 수 없는 설교시간을 지키느라 우울해진 얼굴들…. 이들에 항거하며 거룩하게 위장한 건축물에 발가벗은 인간을 그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길은 정직하게 발가벗는 일이야 소리치는 듯하다.
미켈란젤로의 용기 있는 신앙고백의 예술 작품에 힘입어 세상에 빛이 들어오게 한 르네상스가 보인다. 뜨거운 사랑에서 잉태된 질문과 신앙고백을 정직하게 토해낼 때 몸의 상함도 마다하지 않을 힘이 주어지는가 보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신앙생활은 숨쉬기처럼 쉬운 것임이 새롭다. 어설픈 지식과 욕심을 가진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신앙의 틀과 율법의 기준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고 평가하며 상처를 주며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리는 동안 아픔을 예수님이 느꼈고, 미켈란젤로가 느끼며 하나 되는 진리가 새롭다.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고, 예술 작품을 감상하며 작가와 공감을 이루고, 작품 안에 숨겨진 진리의 음성을 듣고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떻게 살 것인지 인도받으며 예술을 즐기며 사는 삶에 행복이 더해진다.






![[특집 인터뷰] 게이트웨이 신임총장 Dr. Adam Groza](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5/02/Dr-Adam-Groza.webp?resize=150%2C150&ssl=1)



![[박인화.박금님 선교사 부부의 하.우. 남아공 행전] (3) 무엇인들 못할까?](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5/01/Copy-ofCopy-of%EB%B0%95%EC%9D%B8%ED%99%94-%EB%B0%95%EA%B8%88%EB%8B%98-%EB%B6%80%EB%B6%80.jpg?resize=440%2C264&ssl=1)


![[박인화.박금님 선교사 부부의 하.우. 남아공 행전] (2) 이제 시작이다](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5/01/Copy-ofCopy-of%EB%B0%95%EC%9D%B8%ED%99%94-%EB%B0%95%EA%B8%88%EB%8B%98-%EB%B6%80%EB%B6%80.jpg?resize=150%2C150&ssl=1)




![[미드웨스턴 칼럼-안지영]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1)](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0/08/%EC%95%88%EC%A7%80%EC%98%81%EA%B5%90%EC%88%98-web.png?resize=440%2C264&ssl=1)
![[권석균 목사의 설교이야기] 바울의 설교에 나타난 청중과의 소통 (6)](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0/07/web-%EA%B6%8C%EC%84%9D%EA%B7%A0-%EB%AA%A9%EC%82%AC%EB%8B%98.png?resize=150%2C150&ssl=1)

![[목회단상 牧會斷想] 은퇴 후에 폭 익히는 사랑](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3/01/%EC%A7%80%EC%A4%80%ED%98%B8-%EB%AA%A9%EC%82%AC%EB%8B%98.gif?resize=150%2C150&ssl=1)
![에스더 사모의 [진리와 하나된 교육] – 19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3/08/%EB%B0%95%EB%AF%BC%ED%9D%AC-%EC%82%AC%EB%AA%A8.jpg?resize=440%2C264&ssl=1)
![에스더 사모의 [진리와 하나된 교육] – 17 “Soli Deo Gloria”](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3/08/%EB%B0%95%EB%AF%BC%ED%9D%AC-%EC%82%AC%EB%AA%A8.jpg?resize=150%2C150&ssl=1)
![[강태광 목사의 문학의 숲에서 만나는 진리의 오솔길] C. S. 루이스의 작품 산책(3) 순전한 기독교 ②](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0/08/%EA%B0%95%ED%83%9C%EA%B4%91-web.png?resize=440%2C264&ssl=1)








![[사설 社說] 정기총회서 총회 건물 구입 및 새로운 도약의 기회 논의하자](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1/04/%EC%82%AC%EC%84%A4.png?resize=440%2C264&ssl=1)
![[시론 時論] 딸들을 위한 기도](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3/09/%EC%98%A8%EB%9D%BC%EC%9D%B8%EB%8F%84-%EB%B3%80%EA%B2%BD-Dr-Sam-Lee.jpg?resize=150%2C150&ssl=1)

![[특집 인터뷰] 게이트웨이 신임총장 Dr. Adam Groza](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5/02/Dr-Adam-Groza.webp?resize=250%2C250&ssl=1)
![[긴급기도] 최악의 LA 산불 피해 속 남가주지방회장 서종학 목사 “많은 기도 부탁”](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5/01/Screenshot-2025-01-17-080455.png?resize=150%2C150&ssl=1)
![[인터뷰] “하버드생들과 밤새 게임·성경공부”… 부모 마음으로 제자양육](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5/01/%EC%9D%B4%EA%B8%88%ED%95%98%EA%B5%90%EB%AA%A9.jpg?resize=150%2C150&ssl=1)
![[특집] “애벌레가 나비 되듯, 약함이 강함으로” 제11회 전국 사모수양회… 80여 사모 회복과 은혜 체험](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4/12/Resized%EC%82%AC%EB%B3%B8-4568.jpg?resize=150%2C150&ssl=1)






![[다가오는 총회 소개 영상] ③ [인터뷰] 주강사 박성근 목사](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4/05/thum3-re.png?resize=440%2C264&ssl=1)
![[다가오는 총회 소개 영상] ② 정기 총회 장소를 미리 보시죠](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4/05/Slide1-1.jpg?resize=150%2C150&ssl=1)
![[다가오는 총회 소개 영상] ① 총회장 초청·환영 인사](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4/05/R-%EC%8D%B8%EB%84%A4%EC%9D%BC-%EC%B4%9D%ED%9A%8C%EC%9E%A5-%EC%B4%88%EB%8C%80-%EB%B0%8F-%ED%99%98%EC%98%81.jpg?resize=150%2C150&ssl=1)

![[정태회 목사의 삶, 안목, 리더십] 성취와 포기](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0/08/web-%EC%A0%95%ED%83%9C%ED%9A%8C-%EB%AA%A9%EC%82%AC%EB%8B%98.png?resize=440%2C264&ssl=1)
![[박성근 목사의 신앙 & 삶] 기도는 국경을 넘는다](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0/08/%EB%B0%95%EC%84%B1%EA%B7%BC-web.png?resize=440%2C264&ssl=1)
![<span style=" font: bold 0.8em Nanum Gothic, serif ; color: green;">[박인화 목사의 하.나.우 이야기 (5)]</span> </br><span style=" font: bold 0.5em Nanum Gothic, serif ; color: fuchsia;">코로나 시기의 묵상 일기, 어떤가요?</span>](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0/08/%EB%B0%95%EC%9D%B8%ED%99%94-%EB%AA%A9%EC%82%AC%EB%8B%98-web.png?resize=440%2C264&ssl=1)
![<span style=" font: bold 0.8em Nanum Gothic, serif ; color: green;">[무화과나무 아래서 (6)]</span> </br><span style=" font: bold 0.5em Nanum Gothic, serif ; color: fuchsia;">목사님, 믿음이 약해진 것 같아요</span>](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0/08/%EA%B6%81%EC%9D%B8-%EB%AA%A9%EC%82%AC%EB%8B%98-web.png?resize=440%2C264&ssl=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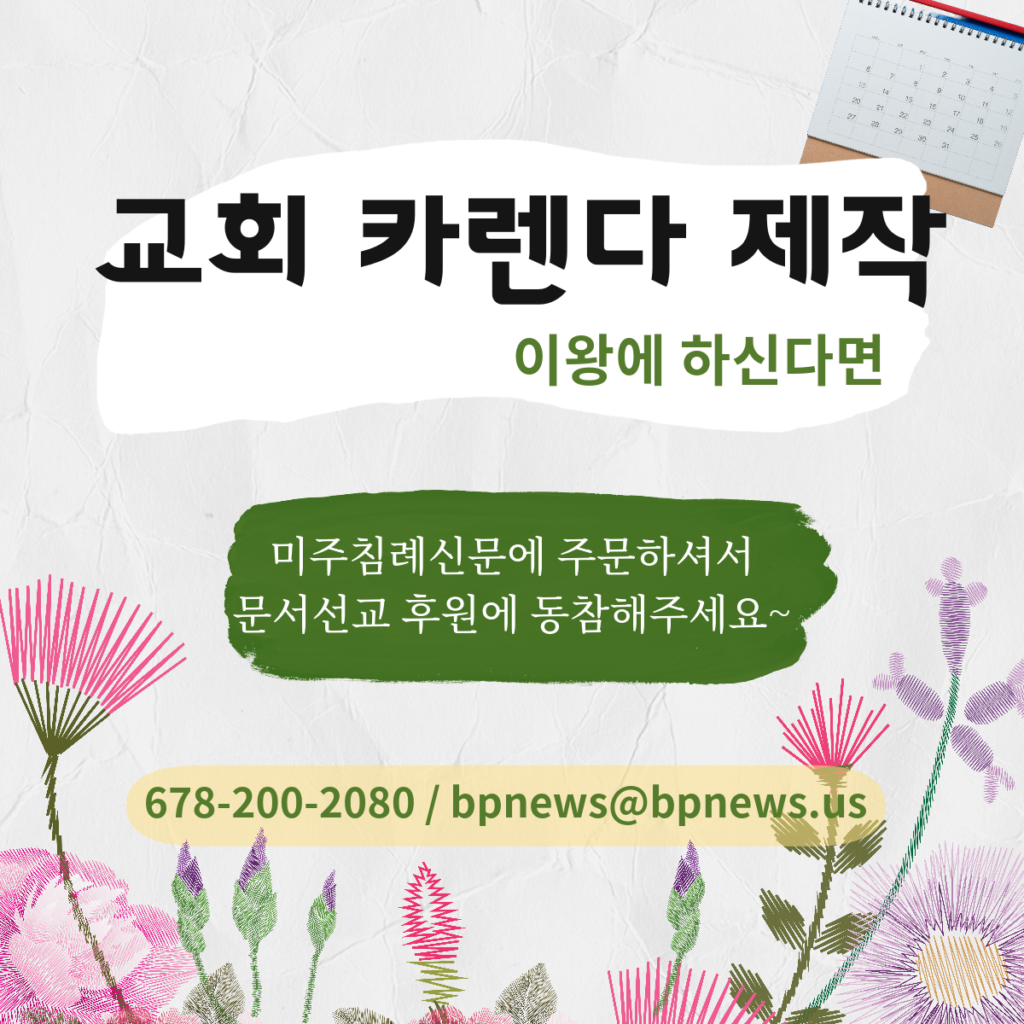

![[특집] “애벌레가 나비 되듯, 약함이 강함으로” 제11회 전국 사모수양회… 80여 사모 회복과 은혜 체험](https://bpnews.us/wp-content/uploads/2024/12/Resized사본-4568-65x65.jpg)
![[특집] 제4회 미주미래목회포럼 성료](https://bpnews.us/wp-content/uploads/2024/12/web-KakaoTalk_20241127_062827557_15-e1734541216798-65x65.jpg)
![[특집] 테네시지방회, 클락스빌 지역에서 ‘비타민, 홍삼보다’ 힘나는 가을모임 개최](https://bpnews.us/wp-content/uploads/2024/10/Screenshot-2024-10-26-194318-65x65.png)
![[특집] “어려운 목회의 길, ‘코칭’이라는 어깨동무 사역으로 함께 간다”](https://bpnews.us/wp-content/uploads/2024/10/코칭단체사진-65x65.png)
![[특집 인터뷰] 게이트웨이 신임총장 Dr. Adam Groza](https://bpnews.us/wp-content/uploads/2025/02/Dr-Adam-Groza-65x65.webp)
![[긴급기도] 최악의 LA 산불 피해 속 남가주지방회장 서종학 목사 “많은 기도 부탁”](https://bpnews.us/wp-content/uploads/2025/01/Screenshot-2025-01-17-080455-65x65.png)
![[인터뷰] “하버드생들과 밤새 게임·성경공부”… 부모 마음으로 제자양육](https://bpnews.us/wp-content/uploads/2025/01/이금하교목-65x6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