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론 時論]
어느 가을에 시(詩)처럼 쓰고 싶은 시론(時論)
![<span style=" font: bold 0.8em Nanum Gothic, serif ; color: green;">[시론 時論]</span> </br><span style=" font: bold 0.5em Nanum Gothic, serif ; color: fuchsia;">어느 가을에 시(詩)처럼 쓰고 싶은 시론(時論)</span>](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0/07/web-%EA%B9%80%EC%98%81%ED%95%98-%EB%AA%A9%EC%82%AC%EB%8B%98.png?resize=1200%2C640&ssl=1)
 김영하 목사(샬롬선교교회, 미주)
김영하 목사(샬롬선교교회, 미주)
어느 가을에 시(詩)처럼 쓰고 싶은 시론(時論)
인제천 굽어 흐르는 논장교 언덕을 따라 나지막이 외진 곳에 알미봉이 사뿐히 앉아있었다. 부라보 포대의 병사들이 탄약고를 지키느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오가는 사이 산비탈에는 워낭소리와 함께 늙은 소의 입에서 하얀 거품이 피어올랐다. 농부의 구성진 이랴, 워 소리에 맞추어 봄부터 경사진 밭을 갈던 누렁이는 들깻잎 냄새를 맡으며 겨울 준비를 했다. 알미봉이 선사한 그 많은 농작물은 오로지 우직한 소의 어깨로 땅을 갈아 낸 결과였다. 농부는 소에게 한동안 밭일을 시키지 않고 편히 쉬게 할 작정이다. 외양간에서 여물을 먹으며 한겨울 동안 알미봉에 올라올 일은 없을 것이다. 눈 녹을 때 즈음 또 밭이며 논에서 힘을 쓰면 되는 것이다.
알미봉에 걸린 해는 금방 저 멀리 대암산으로 자리를 폈다. “수니 딸기 꽃이 세 번 피거든, 수니 그때는 마중을 오오. 수니 그때까지 소식 없거든, 수니 다른 곳에 시집을 가오…” 점이를 수니로 바꾸어 부르며 한 번 더 남은 강원도의 긴 겨울을 나기로 한다. 이제 짬도 먹었으니 이번 겨울의 혹한기 훈련은 그래도 견딜 만할 것이다. 칠성고개 넘기 전 흐르는 실개천에 버드나무 잎이 나면 원통에서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할 마음에 소총을 굳게 잡는다.
상계동 산자락 입구에 굴뚝을 마주하고 옹기종기 모여 앉은 집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며 아이들이 숨바꼭질하던 들판에는 꽹과리 소리가 울려 퍼졌다. 추수를 끝낸 날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집배원에게도 막걸리 한 사발을 권하고 학교에서 삼삼오오 돌아오던 여학생들에게도 막 지저 낸 전을 먹고 가라고 했다. 웅덩이에 개구리알 떠다닐 때면 집도, 이 들판도 내어주어야 하니 올해가 마지막 추수였다. 조상 대대로 낱알갱이를 내주던 이 땅은 15층 아파트를 외지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곧 부모를 따라 뿔뿔이 흩어질 아이들은 볏짚 단 사이를 놀이터 삼아 뛰놀다가 토끼 꼬리마냥 짧은 햇살이 처마에 걸릴 때 흐르던 코를 닦고 내일 놀자고 약속하고 집으로 향한다.
정동의 가로수는 돌담 옆에 가지런히 심겨 있다. 가을의 가로수는 모든 것을 쉬 내줄 수 있을 만큼 넉넉한지 고운 바람에도 제 몸에 붙은 잎을 하나씩 떼어내 돌담에 도장 찍듯이 던져주었다. 낙엽의 촉감! 차가운 돌담이지만 느낄 것은 느낀다. 곧 청소부에 의해 손수레에 태워질 낙엽을 위해 돌담은 자신의 모자 위에 숨겨준다. 그곳에서 자신을 키워준 나무를 바라보다 연인들의 발에 밟히며 부스럭 소리를 낸다. 그 밟힌 자국을 따라 삭풍을 이기면 아지랑이 피어오를 때 즈음 새순이 돋겠지.
산불의 기세는 매서웠다. 시속 90마일의 강풍은 순식간에 나뭇가지를 흔들더니 이내 화염을 일으켰다. 키 큰 나무들 사이로 텀블링하듯 춤을 추던 불꽃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트리듯 온 산 위에 올라탔다. 산자락에 있던 대궐 같은 집 뒤뜰에 풀어놓은 개들이 짖고 사람들은 차를 타고 어디론가 떠났다. 붉게 물든 단풍을 시샘이나 하듯이 산타아나 강풍은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이 남가주에 둥지를 튼 인간들의 가슴에 염장을 질러놓고 조용히 떠났다. 그가 떠난 자리에는 다시 사람들이 몰려와 울타리를 보수하고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사랑하고 살아갈 것이다.
풍요로움은 이별을 준비하는 양식이다. 모진 추위를 견뎌내고 다시 만날 때까지의 슬픔을 견디는 보약이다. 그래서 가을은 각별하고도 상냥하게 너그러움을 선사한다. 우리 주님께서도 보혈의 풍요로움과 함께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견디라고 성령을 보내주셨다. 다시 오시겠다고 굳게 약속하시면서… 그 능력으로 역경을 이긴다.
오늘 아침 공기가 차갑게 살결에 와 닿는다. 벌써 팔 개월째 텅 빈 예배당은 언제 웃음소리와 찬양 소리 넘치려나. 조금 더 참아 보라고 그동안 교회를 살찌우셨나 보다. 이제 곧 추수감사절인데 겨울 지나고 봄이 오면 코로나 두려워하지 않고 교인들 돌아오려나.




![[특집 인터뷰] 게이트웨이 신임총장 Dr. Adam Groza](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5/02/Dr-Adam-Groza.webp?resize=150%2C150&ssl=1)



![[박인화.박금님 선교사 부부의 하.우. 남아공 행전] (3) 무엇인들 못할까?](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5/01/Copy-ofCopy-of%EB%B0%95%EC%9D%B8%ED%99%94-%EB%B0%95%EA%B8%88%EB%8B%98-%EB%B6%80%EB%B6%80.jpg?resize=440%2C264&ssl=1)


![[박인화.박금님 선교사 부부의 하.우. 남아공 행전] (2) 이제 시작이다](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5/01/Copy-ofCopy-of%EB%B0%95%EC%9D%B8%ED%99%94-%EB%B0%95%EA%B8%88%EB%8B%98-%EB%B6%80%EB%B6%80.jpg?resize=150%2C150&ssl=1)




![[특집] 침례교 목회자, 주목할 신간들 집필 이어져 – 목회 도서 4권](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4/11/%EC%A0%9C%EB%AA%A9-%EC%97%86%EC%9D%8C.jpg?resize=150%2C150&ssl=1)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자”](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0/08/%EA%B6%81%EC%9D%B8-%EB%AA%A9%EC%82%AC%EB%8B%98-web.png?resize=440%2C264&ssl=1)
![[정태회 목사의 삶, 안목, 리더십] 뻔뻔함](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0/08/web-%EC%A0%95%ED%83%9C%ED%9A%8C-%EB%AA%A9%EC%82%AC%EB%8B%98.png?resize=440%2C264&ssl=1)
![[이수관 목사의 목회의 길에서] “온전함에 관하여”](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0/08/%EC%9D%B4%EC%88%98%EA%B4%80-%EB%AA%A9%EC%82%AC%EB%8B%98-web.png?resize=150%2C150&ssl=1)
![[박성근 목사의 신앙 & 삶] 상처의 무게](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0/08/%EB%B0%95%EC%84%B1%EA%B7%BC-web.png?resize=150%2C150&ssl=1)
![에스더 사모의 [진리와 하나된 교육] – 18 “숨겨진 가르침”](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3/08/%EB%B0%95%EB%AF%BC%ED%9D%AC-%EC%82%AC%EB%AA%A8.jpg?resize=440%2C264&ssl=1)
![[특집 인터뷰] 게이트웨이 신임총장 Dr. Adam Groza](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5/02/Dr-Adam-Groza.webp?resize=250%2C250&ssl=1)
![에스더 사모의 [진리와 하나된 교육] – 17 “Soli Deo Gloria”](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3/08/%EB%B0%95%EB%AF%BC%ED%9D%AC-%EC%82%AC%EB%AA%A8.jpg?resize=150%2C150&ssl=1)



![[김웅의 성경만화] 기뻐하는 세 식구: 하박국 편](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3/12/%EA%B9%80%EC%9B%85-%EB%AA%A9%EC%82%AC%EB%8B%98-scaled.jpg?resize=150%2C150&ssl=1)



![목회리더십 2025 연례모임 [2025.4.7(월)~9(수), VA]](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5/03/web-mok-re.png?resize=150%2C150&ssl=1)

![[시론 時論] 딸들을 위한 기도](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3/09/%EC%98%A8%EB%9D%BC%EC%9D%B8%EB%8F%84-%EB%B3%80%EA%B2%BD-Dr-Sam-Lee.jpg?resize=388%2C264&ssl=1)
![[사설 社說] 총회의 미래 전략 위한 데이터가 필요하다](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1/04/%EC%82%AC%EC%84%A4.png?resize=150%2C150&ssl=1)
![[시론 時論] 신년을 맞이하며](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3/09/%EC%98%A8%EB%9D%BC%EC%9D%B8%EB%8F%84-%EB%B3%80%EA%B2%BD-Dr-Sam-Lee.jpg?resize=150%2C150&ssl=1)

![[긴급기도] 최악의 LA 산불 피해 속 남가주지방회장 서종학 목사 “많은 기도 부탁”](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5/01/Screenshot-2025-01-17-080455.png?resize=150%2C150&ssl=1)
![[인터뷰] “하버드생들과 밤새 게임·성경공부”… 부모 마음으로 제자양육](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5/01/%EC%9D%B4%EA%B8%88%ED%95%98%EA%B5%90%EB%AA%A9.jpg?resize=150%2C150&ssl=1)
![[특집] “애벌레가 나비 되듯, 약함이 강함으로” 제11회 전국 사모수양회… 80여 사모 회복과 은혜 체험](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4/12/Resized%EC%82%AC%EB%B3%B8-4568.jpg?resize=150%2C150&ssl=1)






![[다가오는 총회 소개 영상] ③ [인터뷰] 주강사 박성근 목사](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4/05/thum3-re.png?resize=440%2C264&ssl=1)
![[다가오는 총회 소개 영상] ② 정기 총회 장소를 미리 보시죠](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4/05/Slide1-1.jpg?resize=150%2C150&ssl=1)
![[다가오는 총회 소개 영상] ① 총회장 초청·환영 인사](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4/05/R-%EC%8D%B8%EB%84%A4%EC%9D%BC-%EC%B4%9D%ED%9A%8C%EC%9E%A5-%EC%B4%88%EB%8C%80-%EB%B0%8F-%ED%99%98%EC%98%81.jpg?resize=150%2C150&ssl=1)

![[사설 社說] 총회의 미래 전략 위한 데이터가 필요하다](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1/04/%EC%82%AC%EC%84%A4.png?resize=440%2C264&ssl=1)
![[사설 社說] 한국교회의 더욱 건강한 성장을 기대한다](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17/09/%EC%82%AC%EC%84%A4.jpg?resize=161%2C171&ssl=1)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자”](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0/08/%EA%B6%81%EC%9D%B8-%EB%AA%A9%EC%82%AC%EB%8B%98-web.png?resize=150%2C150&ssl=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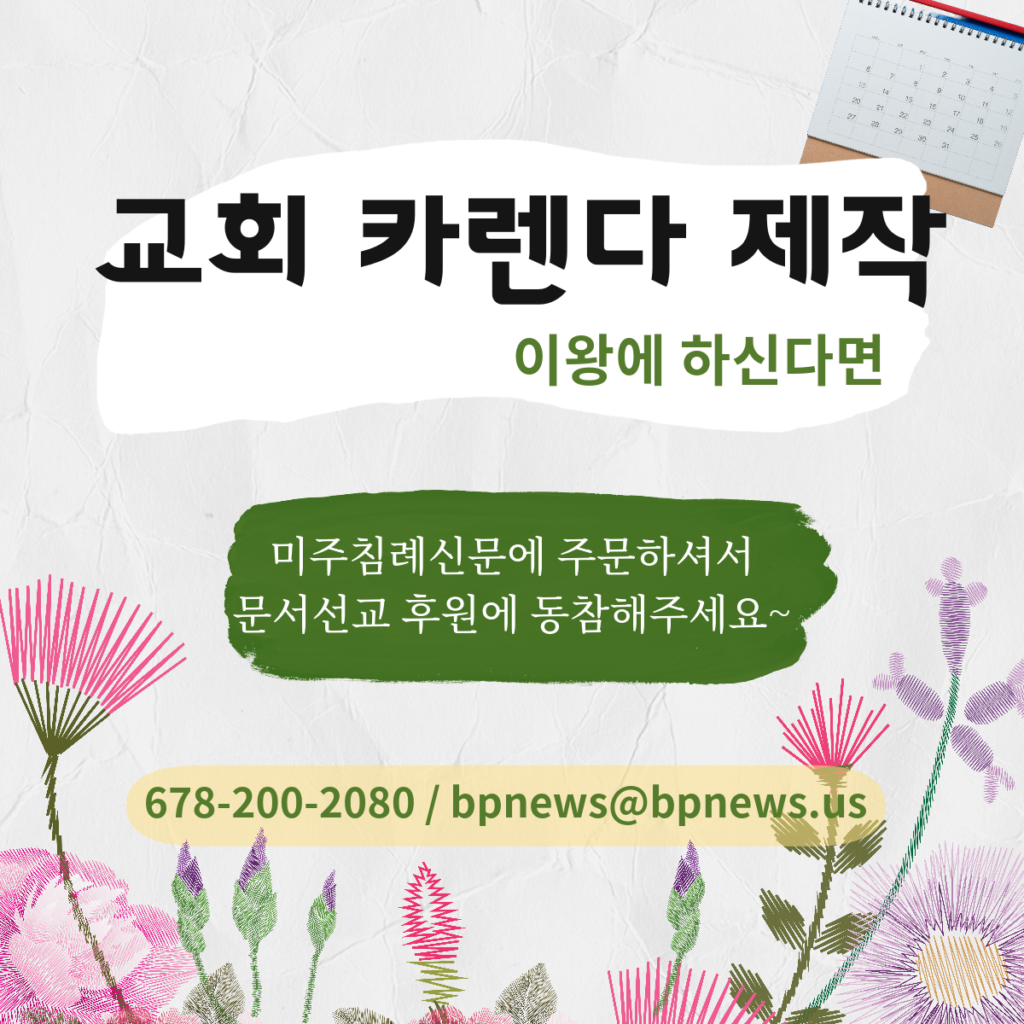

![[특집] “애벌레가 나비 되듯, 약함이 강함으로” 제11회 전국 사모수양회… 80여 사모 회복과 은혜 체험](https://bpnews.us/wp-content/uploads/2024/12/Resized사본-4568-65x65.jpg)
![[특집] 제4회 미주미래목회포럼 성료](https://bpnews.us/wp-content/uploads/2024/12/web-KakaoTalk_20241127_062827557_15-e1734541216798-65x65.jpg)
![[특집] 테네시지방회, 클락스빌 지역에서 ‘비타민, 홍삼보다’ 힘나는 가을모임 개최](https://bpnews.us/wp-content/uploads/2024/10/Screenshot-2024-10-26-194318-65x65.png)
![[특집] “어려운 목회의 길, ‘코칭’이라는 어깨동무 사역으로 함께 간다”](https://bpnews.us/wp-content/uploads/2024/10/코칭단체사진-65x65.png)
![[특집 인터뷰] 게이트웨이 신임총장 Dr. Adam Groza](https://bpnews.us/wp-content/uploads/2025/02/Dr-Adam-Groza-65x65.webp)
![[긴급기도] 최악의 LA 산불 피해 속 남가주지방회장 서종학 목사 “많은 기도 부탁”](https://bpnews.us/wp-content/uploads/2025/01/Screenshot-2025-01-17-080455-65x65.png)
![[인터뷰] “하버드생들과 밤새 게임·성경공부”… 부모 마음으로 제자양육](https://bpnews.us/wp-content/uploads/2025/01/이금하교목-65x6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