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지미 사모의 사모의 뜨락] 전설의 “빨간 피, 파란 피”
![[송지미 사모의 사모의 뜨락] 전설의 “빨간 피, 파란 피”](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17/11/Web_%EC%86%A1%EC%A7%80%EB%AF%B8.jpg?resize=130%2C167&ssl=1)

전설의 “빨간 피, 파란 피”
오랜만에 가져보는 쾌청한(?) 날씨다. 루이지애나의 여름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라면 이 여름의 뜨거운 햇볕이 어떠한지, 습함의 정도는 어떠한지 말 안 해도 알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습한 여름, 끈적끈적한 무더위, 후덥지근함의 극치를 달리는 것이 이곳 루이지애나주의 뉴올리언스가 갖는 대표적인 여름의 날씨이다.
아무리 쾌청한 날이라 해도 후하게 점수를 줘서 그렇다는 것이지 루이지애나의 땡볕 아래서 빨래를 널기 시작한 지 1분도 안돼서 목덜미로부터 땀이 흐른다. 건조기는 왜 하필 이 뜨거운 여름에 고장이야…
옆집 병아리들이 삐약삐약 집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소리가 들린다. 극도로 짧은 시간의 평화 후 곧 소리가 높아진다. 작은 병아리가 비명을 지른다. 큰 병아리도 질세라 더 크게 악을 쓰며 비명 소리를 낸다. 곧 끝날 것 같지 않은 기세다. 아마도 두 병아리의 올라타기, 쪼기 등의 육박전이 시작된다 싶은 그때, 안에 있던 암탉이 뛰어나와 사건을 제압하려 소리를 꼬댁꼬댁(고래고래) 지른다.
나도 저런 시절을 보냈었지, 별로 오래지 않은 일 같은데…
뜨거운 햇볕과 반복적인 손놀림으로 몽롱해진 나는, 옆집 엄마 닭과 두 아들 병아리의 파닥이는 형국에 마침 고만한 또래였던 우리 딸 병아리들과 아빠 닭의 이야기로 마치 꿈을 꾸듯이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2001년 7월, 곧 두 살이 되는 큰 딸과 5개월이 채 못 된 둘째 딸아이와 함께 뉴올리언스 공항에 도착하여 우리 남편은 유학을 시작했고, 1년여의 미국 생활을 어찌어찌 지내다가 나는 두 번째 직장에서 이제 막 트레이닝을 마치고 아직은 낯선 일에 적응해가고 있을 때였다. 다른 직원이 우리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다며 전화를 건네주었다. 남편이 별다른 일이 아니면 직장에 전화를 할 리가 없기에 전화를 받아 드는 내 온몸에 흐르던 피가 갑작스런 급류로 바뀌는 느낌이었다.
“여보, 무, 무슨 일이에요?”
“지금 아이들이, 아이들이, 얘, 얘, 효엘아,,,이, 이따가 다시 전화…!!!”
너무 놀란 가슴은 진정되지 않았고 한 번 정해진 시간을 바꾸는 것이나 미리 통고하지 않은 결근 혹은 조퇴를 최대한 자제해달라는 요청에 수락한터였고 아직도 미국 생활에 융통성이 없는 나였다. 휴대폰도 없던 그 시절 남편이 다시 전화하겠다 한 말에 한 가닥 굳은 희망을 걸고 진정하려 애쓰며 세 시간을 마저 채웠다. 사는 게 뭔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더니, 등등의 평소 나답지 않은 생각과 말을 가슴속에 되뇌며 시간을 간신히 마치고 집에 돌아왔다.
집에 있던 많은 물건들이 이층 난간에 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걸쳐져 있었다. 사태는 어쨌거나 좀 진정이 된 듯했다. 도대체 지금까지 사고 한번 치지 않은 아이들이 무슨 일을 했기에 이처럼 많은 물건들이 이사 가는 집처럼 이렇게 밖에 나와 있을까를 생각하며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다. 남편은 지금까지 숨을 헐떡이며 이것저것 치우고 있는데 내 눈에 들어온 건 아직도 남아있는 뻘겋고 퍼런 얼룩들이었다.
“여보,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애들은 어디 갔어요?”
유학 1년을 힘겹게 마치고 여름 방학을 바쁘게 보낸 후 새 학기가 시작되어 과제다 뭐다 해서 바쁜 일정에 토요일엔 아이들까지 맡아 돌보며 시간을 보내려니 피로가 밀려온 남편은 세 살배기 큰 아이와 두 살배기 둘째 딸아이가 보통 때처럼 이것저것 가지고 노니 아무 생각 없이 노곤한 오후 낮잠에 빠져들었단다. 한참을 자던 남편이 깜짝 놀라 눈을 뜬 건 뭔가 축축한 것이 얼굴에 흘러내려서였다고 한다.
몽롱한 가운데 보이는 건 딸아이의 얼굴… 아이의 얼굴에… 뭔가가 흘러내려… 저게… 뭐야…? 쟤 얼굴이 왜 저래…? 뭐지, 저 애가 지금… 피… 피… 엇, 뭐라고, 피, 피, 피를 흘려???
오락가락 잠에서 헤어나지 못한 남편의 눈에 들어온 아이의 피 흘리는 얼굴… “효엘아, 얘야, 얘야, 얘, 왜 그래? 웬 피야, 피, 왜 그래, 얘, 효엘아!!!”
그는 더 이상 생각할 것 없이 벌떡 일어나 피 흘리는 아이를 들쳐 업고 사정없이 밖으로 뛰어 나가려는데 갑자기 둘째 아이가 생각나 후닥닥 몸을 돌리는데 이제 방에서 막 허우적허우적 걸어 나오는 둘째 아이의 머리에서도 걸쭉한 액체가 흘러나오더란다. 그런데 이건 뭐야, 이건 왜 또 이래… 우리 둘째 아이는 피 색깔까지 잘 못 되었어… 도대체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 하나님, 뭡니까, 이건?!!!”
놀란 남편이 잠깐 정신을 못 차리며 허둥거리는 동안 아빠 등에 업혀 있던 큰 아이가
“아빠, 내려 줘. 효빈이 얼굴 씻겨주게…”하더란다. 아니, 찐덕찐덕 피를 흘리며 죽어 가고 있다고 생각했던 아이가 동생을 씻겨준다고 말을 하기에 등에서 아이를 내려놓고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정신을 가다듬자니 그제야 보이더란다. 저기 아이들 방안에 엎어져 있는 핑거 페인트(finger paint) 병들이… 그동안은 놀 때 항상 조심스럽게 놀던 아이들이고 벽에다 몇 번 색연필과 사인펜으로 그림 그렸던 전적밖에 없던 아이들이었다. 그러니 이런 큰일을 벌이리라 생각지도 못한 터여서 아빠가 헤어날 수 없을 만큼 빠져있던 낮잠의 노곤함에서 현실로 돌아 나올 때, 아빠의 눈에는 아이의 머리에 흐르는 것이 놀다가 다친 아이의 머리에서 찐덕한 피가 흐른다고 생각한 것이다. 둘째 아이에 대해 생각할 틈도 없이 어찌되었건 큰 아이를 들쳐업고 응급실로 뛰어나갈 생각만 했는데 이제는 파란 피를 철철 흘리는 아이가 방에서 나와 언니를 찾았으니, 아직도 놀란 마음에 둘째 아이의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피는 왜 색깔까지 잘못되었느냐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혹독한 낮잠 값을 치렀던 것이다.
이런저런 것 다 치우고 빨아 널고 아이들 씻기고도 놀란 가슴이 진정이 되지 않아 아직도 어리벙벙해하는 아이들 엉덩이를 두 대씩 때려주었다며 이제는 쌔근쌔근 잠들어있는 아이들 얼굴을 보며 살다 살다 이렇게 놀라기는 생전 처음이었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
벌써 15년 전의 일이다. 이제 이번 8월 1일부로 어른 닭이 된 초보 어른 우리 큰 딸이 자랑스럽다. 하나님이 넘버 원이고 가족이 넘버 투라고 말하는 우리 큰 딸. 십 대 사춘기의 시기를 엄마와 함께 넘기며 그동안 애도 자라고 엄마도 자랐다. 열여덟 살 생일이 되기 전날 7월 31일 밤에 자정을 맞으며 “Now I am 18~~~!!!”이라고 외친 우리 큰 딸의 성년의 나이가 의미 있다. 빨간 피, 파란 피의 우리 집 전설을 만들어 내었던 노랑 병아리가 이제 초보 어른 닭이 되었음을 축하하며 나도 한 마디,
“꼬끼요~~~ 저도요~~~ 한 마리요~~~ 키워냈어요~~~~~~!!!”




![[특집 인터뷰] 게이트웨이 신임총장 Dr. Adam Groza](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5/02/Dr-Adam-Groza.webp?resize=150%2C150&ssl=1)





![[박인화.박금님 선교사 부부의 하.우. 남아공 행전] (2) 이제 시작이다](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5/01/Copy-ofCopy-of%EB%B0%95%EC%9D%B8%ED%99%94-%EB%B0%95%EA%B8%88%EB%8B%98-%EB%B6%80%EB%B6%80.jpg?resize=150%2C150&ssl=1)




![[특집] 침례교 목회자, 주목할 신간들 집필 이어져 – 목회 도서 4권](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4/11/%EC%A0%9C%EB%AA%A9-%EC%97%86%EC%9D%8C.jpg?resize=150%2C150&ssl=1)
 “포장을 벗고 진짜가 되자”](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0/08/%EA%B6%81%EC%9D%B8-%EB%AA%A9%EC%82%AC%EB%8B%98-web.png?resize=440%2C264&ssl=1)
![[정태회 목사의 삶, 안목, 리더십] 집요함](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0/08/web-%EC%A0%95%ED%83%9C%ED%9A%8C-%EB%AA%A9%EC%82%AC%EB%8B%98.png?resize=440%2C264&ssl=1)
![[이수관 목사의 목회의 길에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0/08/%EC%9D%B4%EC%88%98%EA%B4%80-%EB%AA%A9%EC%82%AC%EB%8B%98-web.png?resize=150%2C150&ssl=1)
![[박성근 목사의 신앙 & 삶] 시간의 상대성 이론](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0/08/%EB%B0%95%EC%84%B1%EA%B7%BC-web.png?resize=150%2C150&ssl=1)
![[손경일 목사의 세상에서 말씀 찾기] 브라질~~](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1/11/web-%EC%86%90%EA%B2%BD%EC%9D%BC-%EB%AA%A9%EC%82%AC%EB%8B%98.jpg?resize=150%2C150&ssl=1)
![에스더 사모의 [진리와 하나된 교육] – 18 “숨겨진 가르침”](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3/08/%EB%B0%95%EB%AF%BC%ED%9D%AC-%EC%82%AC%EB%AA%A8.jpg?resize=440%2C264&ssl=1)
![[특집 인터뷰] 게이트웨이 신임총장 Dr. Adam Groza](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5/02/Dr-Adam-Groza.webp?resize=250%2C250&ssl=1)
![에스더 사모의 [진리와 하나된 교육] – 17 “Soli Deo Gloria”](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3/08/%EB%B0%95%EB%AF%BC%ED%9D%AC-%EC%82%AC%EB%AA%A8.jpg?resize=150%2C150&ssl=1)




![[강태광 목사의 문학의 숲에서 만나는 진리의 오솔길] C. S. 루이스의 작품 산책(2) 순전한 기독교 ①](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0/08/%EA%B0%95%ED%83%9C%EA%B4%91-web.png?resize=150%2C150&ssl=1)
![[김웅의 성경만화] 성경 배우는 세 집사: 요시야 편](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3/12/%EA%B9%80%EC%9B%85-%EB%AA%A9%EC%82%AC%EB%8B%98-scaled.jpg?resize=150%2C150&ssl=1)
![목회리더십 2025 연례모임 [2025.4.7(월)~9(수), VA]](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5/03/web-mok-re.png?resize=440%2C264&ssl=1)



![[시론 時論] 사랑의 메시지](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3/09/%EC%98%A8%EB%9D%BC%EC%9D%B8%EB%8F%84-%EB%B3%80%EA%B2%BD-Dr-Sam-Lee.jpg?resize=388%2C264&ssl=1)
![[사설 社說] 총회의 미래 전략 위한 데이터가 필요하다](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1/04/%EC%82%AC%EC%84%A4.png?resize=150%2C150&ssl=1)
![[시론 時論] 신년을 맞이하며](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3/09/%EC%98%A8%EB%9D%BC%EC%9D%B8%EB%8F%84-%EB%B3%80%EA%B2%BD-Dr-Sam-Lee.jpg?resize=150%2C150&ssl=1)
![[긴급기도] 최악의 LA 산불 피해 속 남가주지방회장 서종학 목사 “많은 기도 부탁”](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5/01/Screenshot-2025-01-17-080455.png?resize=150%2C150&ssl=1)
![[인터뷰] “하버드생들과 밤새 게임·성경공부”… 부모 마음으로 제자양육](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5/01/%EC%9D%B4%EA%B8%88%ED%95%98%EA%B5%90%EB%AA%A9.jpg?resize=150%2C150&ssl=1)
![[특집] “애벌레가 나비 되듯, 약함이 강함으로” 제11회 전국 사모수양회… 80여 사모 회복과 은혜 체험](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4/12/Resized%EC%82%AC%EB%B3%B8-4568.jpg?resize=150%2C150&ssl=1)






![[다가오는 총회 소개 영상] ③ [인터뷰] 주강사 박성근 목사](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4/05/thum3-re.png?resize=440%2C264&ssl=1)
![[다가오는 총회 소개 영상] ② 정기 총회 장소를 미리 보시죠](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4/05/Slide1-1.jpg?resize=150%2C150&ssl=1)
![[다가오는 총회 소개 영상] ① 총회장 초청·환영 인사](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4/05/R-%EC%8D%B8%EB%84%A4%EC%9D%BC-%EC%B4%9D%ED%9A%8C%EC%9E%A5-%EC%B4%88%EB%8C%80-%EB%B0%8F-%ED%99%98%EC%98%81.jpg?resize=150%2C150&ssl=1)

![[사설 社說] 교권의 추락](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1/04/%EC%82%AC%EC%84%A4.png?resize=440%2C264&ssl=1)
![[심연희 사모의 가정상담칼럼] </br></br> 마인드 게임](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17/10/Web_%EC%8B%AC%EC%97%B0%ED%9D%AC%EC%82%AC%EB%AA%A8.jpg?resize=130%2C168&ssl=1)



![목회리더십 2025 연례모임 [2025.4.7(월)~9(수), VA]](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5/03/web-mok-re.png?resize=150%2C150&ssl=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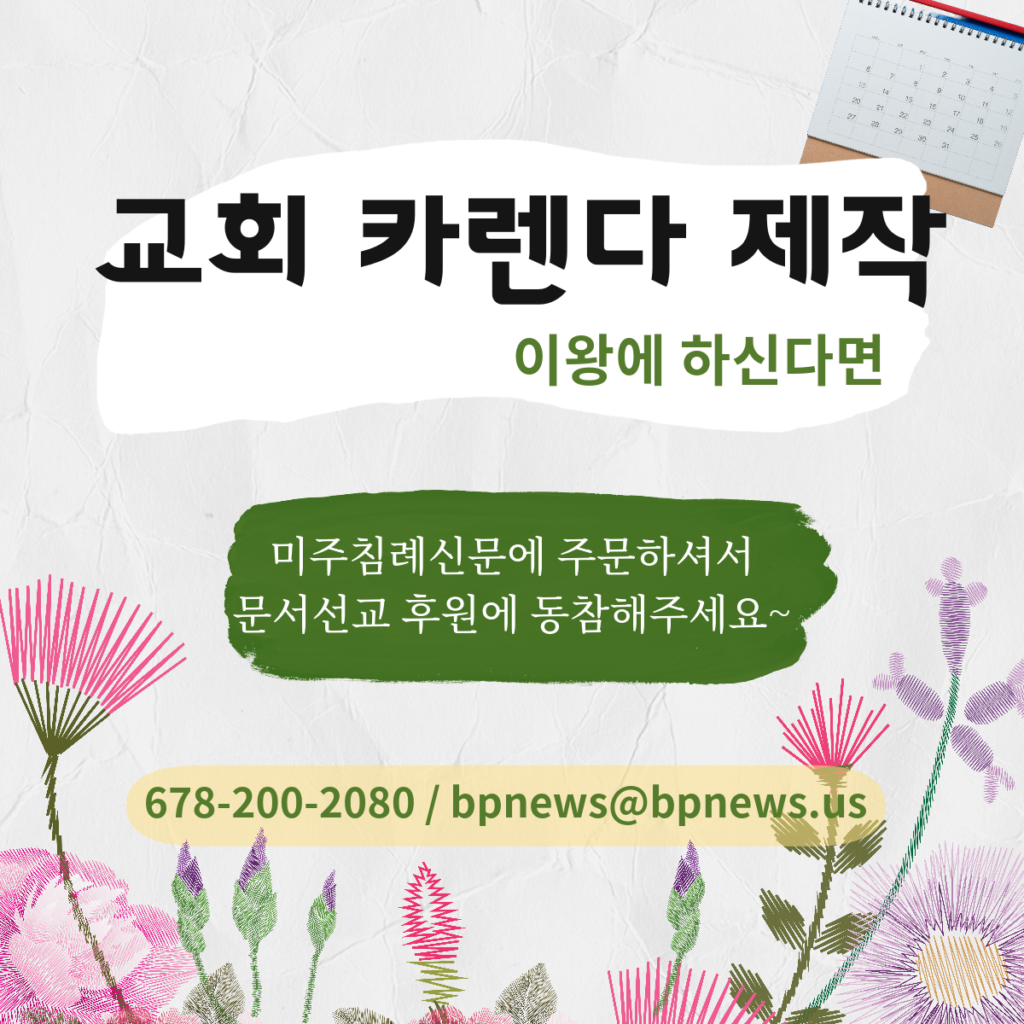

![[특집] “애벌레가 나비 되듯, 약함이 강함으로” 제11회 전국 사모수양회… 80여 사모 회복과 은혜 체험](https://bpnews.us/wp-content/uploads/2024/12/Resized사본-4568-65x65.jpg)
![[특집] 제4회 미주미래목회포럼 성료](https://bpnews.us/wp-content/uploads/2024/12/web-KakaoTalk_20241127_062827557_15-e1734541216798-65x65.jpg)
![[특집] 테네시지방회, 클락스빌 지역에서 ‘비타민, 홍삼보다’ 힘나는 가을모임 개최](https://bpnews.us/wp-content/uploads/2024/10/Screenshot-2024-10-26-194318-65x65.png)
![[특집] “어려운 목회의 길, ‘코칭’이라는 어깨동무 사역으로 함께 간다”](https://bpnews.us/wp-content/uploads/2024/10/코칭단체사진-65x65.png)
![[특집 인터뷰] 게이트웨이 신임총장 Dr. Adam Groza](https://bpnews.us/wp-content/uploads/2025/02/Dr-Adam-Groza-65x65.webp)
![[긴급기도] 최악의 LA 산불 피해 속 남가주지방회장 서종학 목사 “많은 기도 부탁”](https://bpnews.us/wp-content/uploads/2025/01/Screenshot-2025-01-17-080455-65x65.png)
![[인터뷰] “하버드생들과 밤새 게임·성경공부”… 부모 마음으로 제자양육](https://bpnews.us/wp-content/uploads/2025/01/이금하교목-65x6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