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화과나무 아래서 (2)]
“반찬이 왜 이래요?”
![<span style=" font: bold 0.8em Nanum Gothic, serif ; color: green;">[무화과나무 아래서 (2)]</span> </br><span style=" font: bold 0.5em Nanum Gothic, serif ; color: fuchsia;">“반찬이 왜 이래요?”</span>](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0/08/%EA%B6%81%EC%9D%B8-%EB%AA%A9%EC%82%AC%EB%8B%98-web.png?resize=1200%2C640&ssl=1)
 궁인 목사(휴스턴 새누리교회)
궁인 목사(휴스턴 새누리교회)
“반찬이 왜 이래요?”
“반찬이 왜 이래요?”
아이들과 밥 먹다 보면 종종 듣는 말이다. ‘반찬’의 사전적 의미는 주식과 함께 곁들여 먹는 부식이다. 보조적인 음식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여러 나라를 다녀 보아도 우리나라처럼 반찬을 많이 먹는 나라는 거의 보지 못했다. 아니 전 세계에서 메인 요리가 아닌 반찬에 목숨을 거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미국에서 유명한 스테이크를 먹어도 반찬 격인 사이드 디쉬는 몇 가지 샐러드와 감자 프라이가 전부인 경우가 많다. 일본은 더 심하다. 반찬이라고 할 것도 별로 없고, 단무지 한 접시라도 더 먹으려면 돈을 따로 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인의 밥상은 다르다. 반찬 종류는 지방마다 다양하고, 반찬과 메인 요리가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많다. 게다가 식당에서 식사할 때 반찬을 더 요청하면 기꺼이 더 준다. 반찬 서비스 안 하면 장사를 못 할 정도다. 왜 잘 살지도 못했던 우리나라에만 유독 이런 반찬 문화가 있을까?
독자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는가.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인의 반찬에는 매우 중요한 문화 코드가 숨어 있다. 바로 계급 코드다. 조선 시대에는 품계에 따라 반찬의 숫자가 정해져 있었다. 왕은 반찬이 12가지, 고관대작은 9가지, 양반은 7가지, 중인 이하는 5가지 혹은 3가지를 놓고 먹도록 정해 놓았다. 형편에 따라 비싼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저렴한 식재료를 사용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지만, 신분에 따라 반찬의 가지 수를 정해 놓은 것은 놀랍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우리는 가족을 식구라고 부른다. 식구는 먹을 식(食) 입 구(口)로 된 단어다. 우리 문화에서 가족이란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반찬 가지 수만 보더라도 우리의 오랜 문화에서는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었다. 나랑 같은 계급의 사람과만 식사가 가능하다. 결국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계층과 없는 계층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서 창기, 세리, 죄인과 함께 식사했다는 대목을 더 잘 이해하고, 거기서 예수님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을 느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계급 코드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 아마도 이것이 교회에서 더 큰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 양식이든, 중식이든, 일식 요리든 고급 요리를 먹으면 대부분 코스 요리다. 서비스되는 음식이 여러 가지여도 한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은 대부분 같은 음식을 같은 순서로 먹게 된다. 같은 음식을 같은 식사 예절로 먹게 된다. 혼자서 나중에 서비스되는 요리를 먼저 내오라고 요청하는 것은 상당히 매너 없는 행동처럼 비친다.
그러나 한국인의 반상은 다르다. 한국인은 밥과 반찬을 한 번에 다 차려 놓는다. 좋은 음식점에 갈수록 한 번에 나오는 음식의 가짓수는 엄청나다.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다양한 음식이 등장한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반찬이 다르고 먹는 순서나 방법이 전부 다르다. 음식 가지 수만큼이나 그 조합은 복잡해진다.
어떤 사람은 국을 먼저 먹고
어떤 사람은 밥을
어떤 사람은 김치를
어떤 사람은 고기를
또한, 밥과 반찬을 먹는 순서와 양이 사람마다 다르다. 여럿이 먹어도 다 다른 순서, 다른 양으로 먹는다. 그러다 보니 모든 음식이 간이 잘 되고 맛있어도, 자신이 좋아하는 반찬 하나가 자신과 맞지 않으면 투덜대기 일쑤다. 반찬 하나 때문에 요리사는 실력 없는 사람이 되고, 그 식당은 맛없는 집이 된다. 미국은 햄버거 하나만 잘해도 글로벌 기업이 되고, 스테이크 하나만 잘해도 유명 식당 된다. 그러나 한국은 메인 요리뿐만 아니라 반찬도 잘해야 한다. 게다가 반찬은 서비스다. 그러니 부수적인 서비스 준비하다가 메인을 망치는 경우가 많다.
참으로 우리 민족은 그 입맛을 맞추기 힘든 민족이다. 우리는 서양 사람들이 개성이 다양하고 강하다고 말하지만, 정작 개성(?)이 강하고 입맛이 다양한 것은 한국 사람이다. 자기가 먹던 대로만 먹어야 맛있고, 나의 방식대로만 해야 옳은 것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런 반찬 문화는 식당에만 있는 것이 아닌 듯싶다. 교회 사역에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다.
내가 먹던 대로 먹어야 맛있다고 여기는 것처럼
내가 믿던 데로 믿어야 정상이고
내가 하던 방법대로만 해야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도 교회 안에 많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를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단일 메뉴만 40년간 공급했는지 모르겠다. 무엇 하나 새로 주거나 시작할 때마다 다양한 요구에 직면하기 싫으셨는지도 모르겠다. 매번 백성들이 ‘좋네, 나쁘네’ 할 때마다 모세를 만나는 것도 매우 번거로운 일일 것이다.
그런데 요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는 것 같이 코로나라는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광야를 걷고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다양한 아이디어와 다양한 생각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입맛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은 하나의 목표에 집중해야 하는 때이다. 다양한 입맛을 요구할 때도, 다양한 입맛에 맞출 때도 아니다.
오직 빌립보서에서 고백한 바울의 고백처럼 지난 일은 잊어버리고, 오직 우리 앞에 있는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 본질이 아닌 부수적인 것에 대한 논쟁은 내려놓고, 사명을 향해 달려갈 때이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빌립보서 3:13)
이때 우리는 반찬 타령 같은 부수적인 소리에 방해받지 않고, 비전과 사명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특집 인터뷰] 게이트웨이 신임총장 Dr. Adam Groza](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5/02/Dr-Adam-Groza.webp?resize=150%2C150&ssl=1)



![[박인화.박금님 선교사 부부의 하.우. 남아공 행전] (3) 무엇인들 못할까?](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5/01/Copy-ofCopy-of%EB%B0%95%EC%9D%B8%ED%99%94-%EB%B0%95%EA%B8%88%EB%8B%98-%EB%B6%80%EB%B6%80.jpg?resize=440%2C264&ssl=1)


![[박인화.박금님 선교사 부부의 하.우. 남아공 행전] (2) 이제 시작이다](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5/01/Copy-ofCopy-of%EB%B0%95%EC%9D%B8%ED%99%94-%EB%B0%95%EA%B8%88%EB%8B%98-%EB%B6%80%EB%B6%80.jpg?resize=150%2C150&ssl=1)




![[특집] 침례교 목회자, 주목할 신간들 집필 이어져 – 목회 도서 4권](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4/11/%EC%A0%9C%EB%AA%A9-%EC%97%86%EC%9D%8C.jpg?resize=150%2C150&ssl=1)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자”](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0/08/%EA%B6%81%EC%9D%B8-%EB%AA%A9%EC%82%AC%EB%8B%98-web.png?resize=440%2C264&ssl=1)
![[정태회 목사의 삶, 안목, 리더십] 뻔뻔함](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0/08/web-%EC%A0%95%ED%83%9C%ED%9A%8C-%EB%AA%A9%EC%82%AC%EB%8B%98.png?resize=440%2C264&ssl=1)
![[이수관 목사의 목회의 길에서] “온전함에 관하여”](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0/08/%EC%9D%B4%EC%88%98%EA%B4%80-%EB%AA%A9%EC%82%AC%EB%8B%98-web.png?resize=150%2C150&ssl=1)
![[박성근 목사의 신앙 & 삶] 상처의 무게](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0/08/%EB%B0%95%EC%84%B1%EA%B7%BC-web.png?resize=150%2C150&ssl=1)
![에스더 사모의 [진리와 하나된 교육] – 18 “숨겨진 가르침”](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3/08/%EB%B0%95%EB%AF%BC%ED%9D%AC-%EC%82%AC%EB%AA%A8.jpg?resize=440%2C264&ssl=1)
![[특집 인터뷰] 게이트웨이 신임총장 Dr. Adam Groza](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5/02/Dr-Adam-Groza.webp?resize=250%2C250&ssl=1)
![에스더 사모의 [진리와 하나된 교육] – 17 “Soli Deo Gloria”](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3/08/%EB%B0%95%EB%AF%BC%ED%9D%AC-%EC%82%AC%EB%AA%A8.jpg?resize=150%2C150&ssl=1)


![[김웅의 성경만화] 기뻐하는 세 식구: 하박국 편](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3/12/%EA%B9%80%EC%9B%85-%EB%AA%A9%EC%82%AC%EB%8B%98-scaled.jpg?resize=440%2C264&ssl=1)



![목회리더십 2025 연례모임 [2025.4.7(월)~9(수), VA]](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5/03/web-mok-re.png?resize=440%2C264&ssl=1)


![[시론 時論] 딸들을 위한 기도](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3/09/%EC%98%A8%EB%9D%BC%EC%9D%B8%EB%8F%84-%EB%B3%80%EA%B2%BD-Dr-Sam-Lee.jpg?resize=388%2C264&ssl=1)
![[사설 社說] 총회의 미래 전략 위한 데이터가 필요하다](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1/04/%EC%82%AC%EC%84%A4.png?resize=150%2C150&ssl=1)
![[시론 時論] 신년을 맞이하며](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3/09/%EC%98%A8%EB%9D%BC%EC%9D%B8%EB%8F%84-%EB%B3%80%EA%B2%BD-Dr-Sam-Lee.jpg?resize=150%2C150&ssl=1)

![[긴급기도] 최악의 LA 산불 피해 속 남가주지방회장 서종학 목사 “많은 기도 부탁”](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5/01/Screenshot-2025-01-17-080455.png?resize=150%2C150&ssl=1)
![[인터뷰] “하버드생들과 밤새 게임·성경공부”… 부모 마음으로 제자양육](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5/01/%EC%9D%B4%EA%B8%88%ED%95%98%EA%B5%90%EB%AA%A9.jpg?resize=150%2C150&ssl=1)
![[특집] “애벌레가 나비 되듯, 약함이 강함으로” 제11회 전국 사모수양회… 80여 사모 회복과 은혜 체험](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4/12/Resized%EC%82%AC%EB%B3%B8-4568.jpg?resize=150%2C150&ssl=1)






![[다가오는 총회 소개 영상] ③ [인터뷰] 주강사 박성근 목사](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4/05/thum3-re.png?resize=440%2C264&ssl=1)
![[다가오는 총회 소개 영상] ② 정기 총회 장소를 미리 보시죠](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4/05/Slide1-1.jpg?resize=150%2C150&ssl=1)
![[다가오는 총회 소개 영상] ① 총회장 초청·환영 인사](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4/05/R-%EC%8D%B8%EB%84%A4%EC%9D%BC-%EC%B4%9D%ED%9A%8C%EC%9E%A5-%EC%B4%88%EB%8C%80-%EB%B0%8F-%ED%99%98%EC%98%81.jpg?resize=150%2C150&ssl=1)

![<span style=" font: bold 0.8em Nanum Gothic, serif ; color: green;">[미드웨스턴 신학칼럼-정우현 교수]</span> </br><span style=" font: bold 0.5em Nanum Gothic, serif ; color: fuchsia;">신앙성숙의 단계-신앙성숙의 4단계</span> </br><span style=" font: bold 0.5em Nanum Gothic, serif ; color: fuchsia;">1단계: 아브라함 이야기</span>](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18/03/Web_%EC%A0%95%EC%9A%B0%ED%98%84-%EA%B5%90%EC%88%98%EB%8B%98.jpg?resize=130%2C181&ssl=1)
![[박성근 목사의 신앙 & 삶]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0/08/%EB%B0%95%EC%84%B1%EA%B7%BC-web.png?resize=440%2C264&ssl=1)
![<span style=" font: bold 0.8em Nanum Gothic, serif ; color: green;">[정태회 목사의 삶, 안목, 리더십]</span> </br><span style=" font: bold 0.5em Nanum Gothic, serif ; color: fuchsia;">위기</span>](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17/10/Web_%EC%A0%95%ED%83%9C%ED%9A%8C.jpg?resize=130%2C151&ssl=1)
![[미드웨스턴 컬럼] 심민수 교수 – 한 백성(λαός) 개념과 리더십](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18/03/Web_%EC%8B%AC%EB%AF%BC%EC%88%98.jpg?resize=130%2C160&ssl=1)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자”](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0/08/%EA%B6%81%EC%9D%B8-%EB%AA%A9%EC%82%AC%EB%8B%98-web.png?resize=150%2C150&ssl=1)
![[정태회 목사의 삶, 안목, 리더십] 뻔뻔함](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0/08/web-%EC%A0%95%ED%83%9C%ED%9A%8C-%EB%AA%A9%EC%82%AC%EB%8B%98.png?resize=150%2C150&ssl=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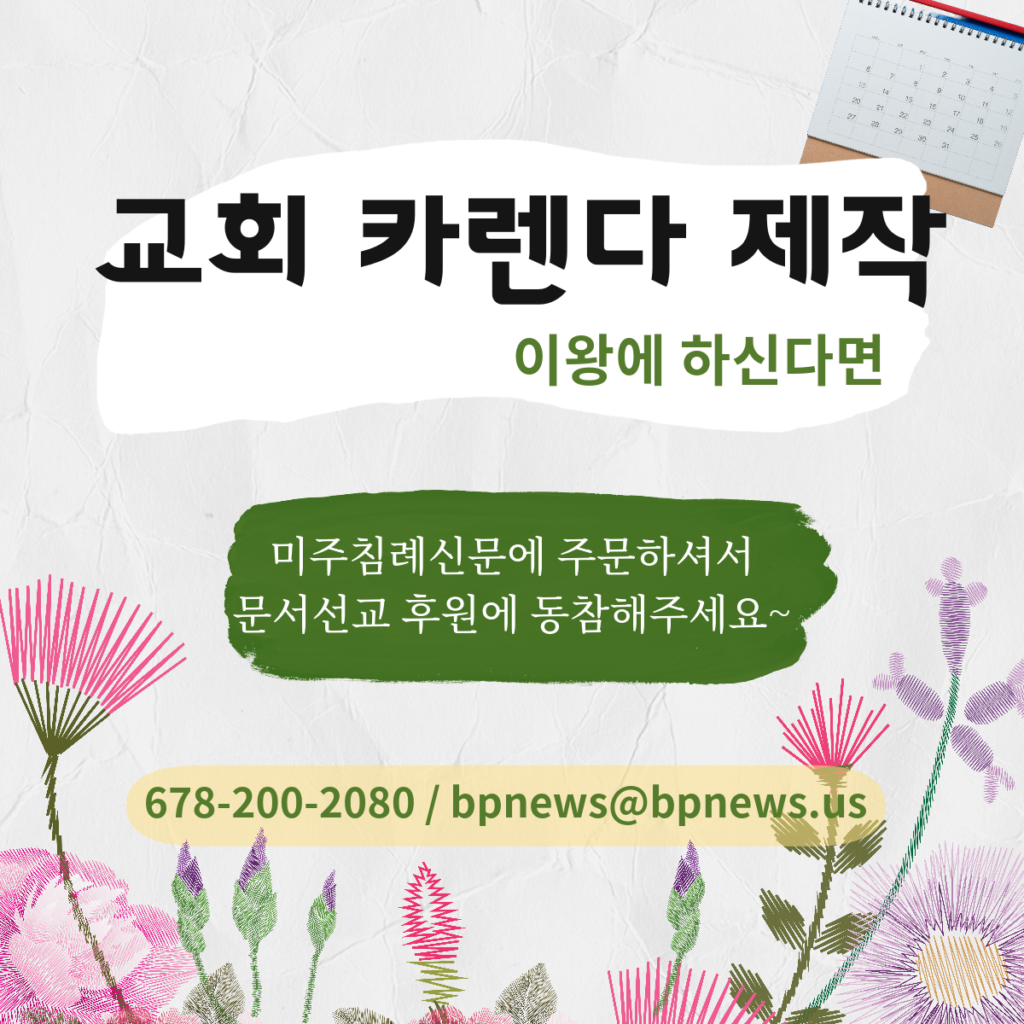

![[특집] “애벌레가 나비 되듯, 약함이 강함으로” 제11회 전국 사모수양회… 80여 사모 회복과 은혜 체험](https://bpnews.us/wp-content/uploads/2024/12/Resized사본-4568-65x65.jpg)
![[특집] 제4회 미주미래목회포럼 성료](https://bpnews.us/wp-content/uploads/2024/12/web-KakaoTalk_20241127_062827557_15-e1734541216798-65x65.jpg)
![[특집] 테네시지방회, 클락스빌 지역에서 ‘비타민, 홍삼보다’ 힘나는 가을모임 개최](https://bpnews.us/wp-content/uploads/2024/10/Screenshot-2024-10-26-194318-65x65.png)
![[특집] “어려운 목회의 길, ‘코칭’이라는 어깨동무 사역으로 함께 간다”](https://bpnews.us/wp-content/uploads/2024/10/코칭단체사진-65x65.png)
![[특집 인터뷰] 게이트웨이 신임총장 Dr. Adam Groza](https://bpnews.us/wp-content/uploads/2025/02/Dr-Adam-Groza-65x65.webp)
![[긴급기도] 최악의 LA 산불 피해 속 남가주지방회장 서종학 목사 “많은 기도 부탁”](https://bpnews.us/wp-content/uploads/2025/01/Screenshot-2025-01-17-080455-65x65.png)
![[인터뷰] “하버드생들과 밤새 게임·성경공부”… 부모 마음으로 제자양육](https://bpnews.us/wp-content/uploads/2025/01/이금하교목-65x6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