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회단상 牧會斷想] 노을 같은 작품을 만들어 봐야지
![[목회단상 牧會斷想] 노을 같은 작품을 만들어 봐야지](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3/01/%EC%A7%80%EC%A4%80%ED%98%B8-%EB%AA%A9%EC%82%AC%EB%8B%98.gif?resize=1200%2C640&ssl=1)

“노을 같은 작품을 만들어 봐야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내 몸과 마음은 온 힘을 다해 행복을 좇았다.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안 될 것 같아 하나님의 자비로운 도움을 바라고 아부 같은 기도를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행복은 잡힐 듯 잡힐 듯 반 발짝 앞에 있었다. 더러는 밤하늘에서 떨어지는 찬란한 별똥별처럼 나의 삶에 훅 들어와 기쁨을 주기도 했다. 웬일인지 그때마다 난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새로운 것을 좇았다. 그러면서 행복을 바라지 않는 척, 달관한 척 허풍을 떨었다. 그리고 인생은 본래 고통이라 떠벌이며 하늘을 쳐다보고 불평했다.
많은 세월 열심히, 그리고 힘겹게 살았다고 자부하며 저녁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름답고 신비한 모습에 눈을 뗄 수 없었다. 노을의 붉은빛이 반짝 색을 내고는 시비를 걸었다.
“부러워?”
“부럽지.”
“내가 어떻게 하늘을 아름답게 물들이는지도 모르고 부러워만 하면 어떻게 해.”
무시하는 듯한 말에 마음이 틀어진 난 무안을 줄 작정으로 아는 걸 쏟아냈다.
“가시광선의 다양한 색이 대기를 뚫고 들어와 칼라의 성질로 반사하는 현상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 푸른색은 짧은 거리에 있는 대기에, 붉은색은 먼 곳에 있는 대기에 반사하면서 창조된 아름다움을…”
“그렇게 잘 알면서. 넌 왜 나를 부러워하기만 해?”
망치에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진 내게 “개성 있는 모든 고유한 존재들이 그들이 처한 상황에 부딪히고 반응하며 각기 다른 결과를 연출하고, 그것이 멋진 예술 작품이 되고, 그러며 신이 주신 행복을 맛보는 것인데… 너의 생활을 마주하고 반성하고 반추하고, 삶을 예술로 만들면서 지고한 행복을 누려 봐” 부드럽게 이야기했다.
난 알몸을 드러낸 것처럼 얼굴이 화끈거렸다.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을 예술로 만들 생각도 못 하고, 순간순간의 행복을 누리지 못한 억울함에 “아…”하는 신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육체적인 생존 본능과 오만가지 감정과 생각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욕심으로, 하나님도 만족시킬 수 없을 행복을 열심히 좇기만 하다니. 지난 세월이 잃어버린 보석처럼 아깝다.
과거를 돌이켜 보았다. 세상에서 가장 먼저 누린, 온전한 행복이 떠올랐다. 어머니 품에 안겨 젖꼭지를 물고 어머니와 눈 맞춤하던 순간, 그리고 자라며 먹고 마시고 배출할 때, 천진난만한 소꿉동무들과 인생의 전부를 같이하는 양 놀이에 열중했을 때, 때와 장소에 따라 변화하는 신비 가득한 산과 강과 들, 그 속에 사는 온갖 생명들의 생존 기술과 꽃과 열매들을 감상하고 그들과 어우러질 때, 살갗을 애무하듯 스치는 시원한 산들바람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눈은 감고, 입을 벌려 들이마실 때, 사랑하는 이와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 무아지경에 있을 때, 그렇게 태어난 사랑스러운 자녀들의 재롱을 보며 생명의 신비와 자신의 존재를 느낄 때, 정의가 불의를 이기는 것을 볼 때, 힘든 고비를 극복하고 마침내 소원하던 것을 이루었을 때, 수많은 이에게 존경과 부러움의 시선을 받을 때 등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순간이 행복이었다. 그런데 흘러가는 구름 보듯 이들을 지나쳐버리고 뒤늦게 그리워하고만 있다니… 저녁노을이 나의 어리석음을 콕 집어 드러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맛보아야 할 행복이 지금 네 앞에 있는 것을 이제 알겠어?” 메말라 시든 화초가 단비를 맞고 싱글싱글 생기를 뽐내듯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용기가 솟았다.
‘모든 순간과 장소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부딪치는 것을 정직하게 표현해야지. 하지만 약점과 무지와 슬픈 감정을 가진 연약한 존재들을 만날 땐 지혜와 사랑으로 헤아려야지. 과거에서 추억을 끄집어내고, 교훈 삼을 만한 것으로 현재의 능력과 가치를 높이고, 미래를 꿈꾸며 추진력으로 삼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동원해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봐야지.’
내가 만났던 과거와, 지금 만나고 있는 현재와, 언젠가 만나게 될 미래 모두를 글로 표현하기로 했다. 그런데, 아뿔싸. 써 놓은 글이 레이저 거울이 되어 “네 안에 있는 지저분하고 혼탁한 욕심들 위에 누더기 옷을 자꾸 껴 입히고 있잖아”라며 타박을 했다. 그리고 “넌 어휘력이 부족해. 독서량이 적잖아. 거기에 글재주까지 없으니” 한숨 쉬며 기를 죽였다. 그래 놓고는 불쌍한 듯 따뜻한 온기로 어깨를 감싸 안고 이야기했다.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들어 봐. 맑고 아름답고 선명하게 너의 가슴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리고 싶은 마음을 나는 잘 알아. 그런데 아직도 새해 아침 상쾌하게 까치가 짖어대는 소리를 들으면 반가운 손님이 올 거라 들뜨고, 쾌청한 하늘에 오색 무지개가 나타나면 기쁜 일의 사인이라 좋아하고, 새벽녘 뒷동산에서 떠 오르는 붉은 태양을 보면 용기가 솟곤 하잖아. 그건 너무 올드하지 않아? AI가 판치는 시대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개살구 같은 내 신앙이 보였다. 그래서 의기소침해진 내게 “진실하려 애쓰는 이, 기복신앙, 율법주의, 상품을 팔기 위해 나오는 이, 배우자를 찾으러 나오는 이, 거룩한 명예를 얻으러 나오는 이, 성직자의 수행과 거룩함으로 대리만족하려는 이, 배운 자, 못 배운 자, 가진 자, 못 가진 자, 어린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들을 위해 사랑과 위선의 사각지대에서 직분을 감당하느라 흘린 땀과 눈물을 내가 다 알아. 보람도 상처도 허망함도 함께 있었지? 하지만 너의 자존심, 이기심, 영웅심, 욕심, 먹고사는 문제까지 어우러져 더 무거운 짐이 된 것 아니야? 그렇게 경험한 모든 것들을 써봐. 난 레이저 광선을 쏘아 네가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하고, 너는 고치고 또 고치며 마음을 맑고 평화스럽게 만들어 보지 않겠어? 그것이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짓는 기초거든.”이라고 이야기했다.
난 고개를 끄떡여 동의하면서도 오묘한 감정들에 메이고, 말해야 할 것을 아직도 하지 못한 채 끙끙거리며 우울해했다. 이런 내게 레이저 광선이 다정한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괜찮아. 인간이란 다 그런 거니까. 대신 책상 위에 있는 하얀 종이에 네 속에 있는 것들을 모두 적어 봐. 아픔도, 기쁨도, 너를 우울하게 하는 것과 서럽게 하는 것 그리고 아름다움이나 고상한 것, 의문점 등 뭐든지. 웅덩이의 물이 빠지면 물고기들이 꼼틀거리며 기어 나오듯 알지 못했던 신선한 것들이 하나둘 기어 나올걸. 그러면 그것으로 문장을 만들고 문단을 만들어 봐. 저녁노을처럼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만들어질 거야. 하나님 형상 닮은 존재가치가 누릴 행복을 맛보게 될 거야.”
나는 오만가지 물감을 백지 옆에 놓고 가슴속 가득한 세계를 그릴 마음에 흥분되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오묘한 진리와 행복하게 되는 길을 드러내는 사명을 주신 것 같았다. 하지만 “과연 모두를 나타낼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다. 그러나 창의와 상상력이 내 안에서 활동을 개시하는 것 같았다. “자연과 이웃과 사회와 물질과의 관계가 하나 되었고, 되고, 되기를 꿈꾸는 모든 것들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을 하얀 백지 위에 그려봐야지. 그리고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며 인도하시는 분과 함께 저녁노을 같은 아름다운 예술 작품 만들어 봐야지.”


![[특집] “10 비전으로 죽은 교회가 살아난다” – 2025 목회 리더십 연례모임 성료](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5/04/ResizedIMG_9244-%EB%B3%B5%EC%82%AC.jpg?resize=440%2C264&ssl=1)
![[특집] “선교를 가져왔다” – 실리콘밸리에 선포된 하나님 마음](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5/04/ResizedIMG_8036.jpg?resize=440%2C264&ssl=1)




![[박인화.박금님 선교사 부부의 하.우. 남아공 행전] (4) 왜 아직도 기분이 좋을까?](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5/04/Copy-of%EB%B0%95%EC%9D%B8%ED%99%94-%EB%B0%95%EA%B8%88%EB%8B%98-%EB%B6%80%EB%B6%802.jpg?resize=440%2C264&ssl=1)
![[박인화.박금님 선교사 부부의 하.우. 남아공 행전] (3) 무엇인들 못할까?](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5/04/Copy-of%EB%B0%95%EC%9D%B8%ED%99%94-%EB%B0%95%EA%B8%88%EB%8B%98-%EB%B6%80%EB%B6%802.jpg?resize=150%2C150&ssl=1)





![[권석균 목사의 설교이야기] 바울의 설교에 나타난 청중과의 소통 (7)](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0/07/web-%EA%B6%8C%EC%84%9D%EA%B7%A0-%EB%AA%A9%EC%82%AC%EB%8B%98.png?resize=440%2C264&ssl=1)
![[이수관 목사의 목회의 길에서] “할아버지가 된다는 것”](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0/08/%EC%9D%B4%EC%88%98%EA%B4%80-%EB%AA%A9%EC%82%AC%EB%8B%98-web.png?resize=440%2C264&ssl=1)
![[박성근 목사의 신앙 & 삶] 말하기 전에 THINK 하라](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0/08/%EB%B0%95%EC%84%B1%EA%B7%BC-web.png?resize=150%2C150&ssl=1)
![[손경일 목사의 세상에서 말씀 찾기] 종교적 에고를 넘어 한 영혼을 향한 부흥으로](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1/11/web-%EC%86%90%EA%B2%BD%EC%9D%BC-%EB%AA%A9%EC%82%AC%EB%8B%98.jpg?resize=150%2C150&ssl=1)
![[미드웨스턴 칼럼-안지영]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2)](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0/08/%EC%95%88%EC%A7%80%EC%98%81%EA%B5%90%EC%88%98-web.png?resize=150%2C150&ssl=1)
![[한국 글로벌선진학교] 개교 20년 만에 세계적 명문학교로 발돋움](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4/02/a61e2c74894ad39fec2cfbf4deb60bab_4mRP7Q2e_64a8f42de92f62b64bd4b54666a72c70ce0a6d42.jpg?resize=440%2C264&ssl=1)
![에스더 사모의 [진리와 하나된 교육] – 20 “교실에서 회복되는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배움의 자리”](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3/08/%EB%B0%95%EB%AF%BC%ED%9D%AC-%EC%82%AC%EB%AA%A8.jpg?resize=440%2C264&ssl=1)
![에스더 사모의 [진리와 하나된 교육] – 19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3/08/%EB%B0%95%EB%AF%BC%ED%9D%AC-%EC%82%AC%EB%AA%A8.jpg?resize=150%2C150&ssl=1)
![[특집 인터뷰] 게이트웨이 신임총장 Dr. Adam Groza](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5/02/Dr-Adam-Groza.webp?resize=150%2C150&ssl=1)
![[강태광 목사의 문학의 숲에서 만나는 진리의 오솔길] C. S. 루이스의 작품 산책(4) 순전한 기독교 내용 정리](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0/08/%EA%B0%95%ED%83%9C%EA%B4%91-web.png?resize=440%2C264&ssl=1)


![[김웅의 성경만화] 기뻐하는 세 집사: 누가 편](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3/12/%EA%B9%80%EC%9B%85-%EB%AA%A9%EC%82%AC%EB%8B%98-scaled.jpg?resize=150%2C150&ssl=1)




![[시론 時論] 선지자적 음성을 회복하라](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3/09/%EC%98%A8%EB%9D%BC%EC%9D%B8%EB%8F%84-%EB%B3%80%EA%B2%BD-Dr-Sam-Lee.jpg?resize=388%2C264&ssl=1)
![[사설 社說] AI와 목회 환경의 변화: 우리의 준비가 시급하다](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1/04/%EC%82%AC%EC%84%A4.png?resize=150%2C150&ssl=1)








![[다가오는 총회 소개 영상] ③ [인터뷰] 주강사 박성근 목사](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4/05/thum3-re.png?resize=440%2C264&ssl=1)
![[다가오는 총회 소개 영상] ② 정기 총회 장소를 미리 보시죠](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4/05/Slide1-1.jpg?resize=150%2C150&ssl=1)
![[다가오는 총회 소개 영상] ① 총회장 초청·환영 인사](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4/05/R-%EC%8D%B8%EB%84%A4%EC%9D%BC-%EC%B4%9D%ED%9A%8C%EC%9E%A5-%EC%B4%88%EB%8C%80-%EB%B0%8F-%ED%99%98%EC%98%81.jpg?resize=150%2C150&ssl=1)

![[정태회 목사의 삶, 안목, 리더십] 긴장감](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17/10/Web_%EC%A0%95%ED%83%9C%ED%9A%8C.jpg?resize=130%2C151&ssl=1)
![[박성근 목사의 신앙 & 삶] 기도는 국경을 넘는다](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0/08/%EB%B0%95%EC%84%B1%EA%B7%BC-web.png?resize=440%2C264&ssl=1)
![[박성근 목사의 신앙 & 삶] </br></br> 부흥은 신비로운 것이 아닙니다](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17/10/Web_%EB%B0%95%EC%84%B1%EA%B7%BC.jpg?resize=130%2C149&ssl=1)

![[권석균 목사의 설교이야기] 바울의 설교에 나타난 청중과의 소통 (7)](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0/07/web-%EA%B6%8C%EC%84%9D%EA%B7%A0-%EB%AA%A9%EC%82%AC%EB%8B%98.png?resize=150%2C150&ssl=1)

![[특집] “10 비전으로 죽은 교회가 살아난다” – 2025 목회 리더십 연례모임 성료](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5/04/ResizedIMG_9244-%EB%B3%B5%EC%82%AC.jpg?resize=150%2C150&ssl=1)
![[한국 글로벌선진학교] 개교 20년 만에 세계적 명문학교로 발돋움](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4/02/a61e2c74894ad39fec2cfbf4deb60bab_4mRP7Q2e_64a8f42de92f62b64bd4b54666a72c70ce0a6d42.jpg?resize=150%2C150&ssl=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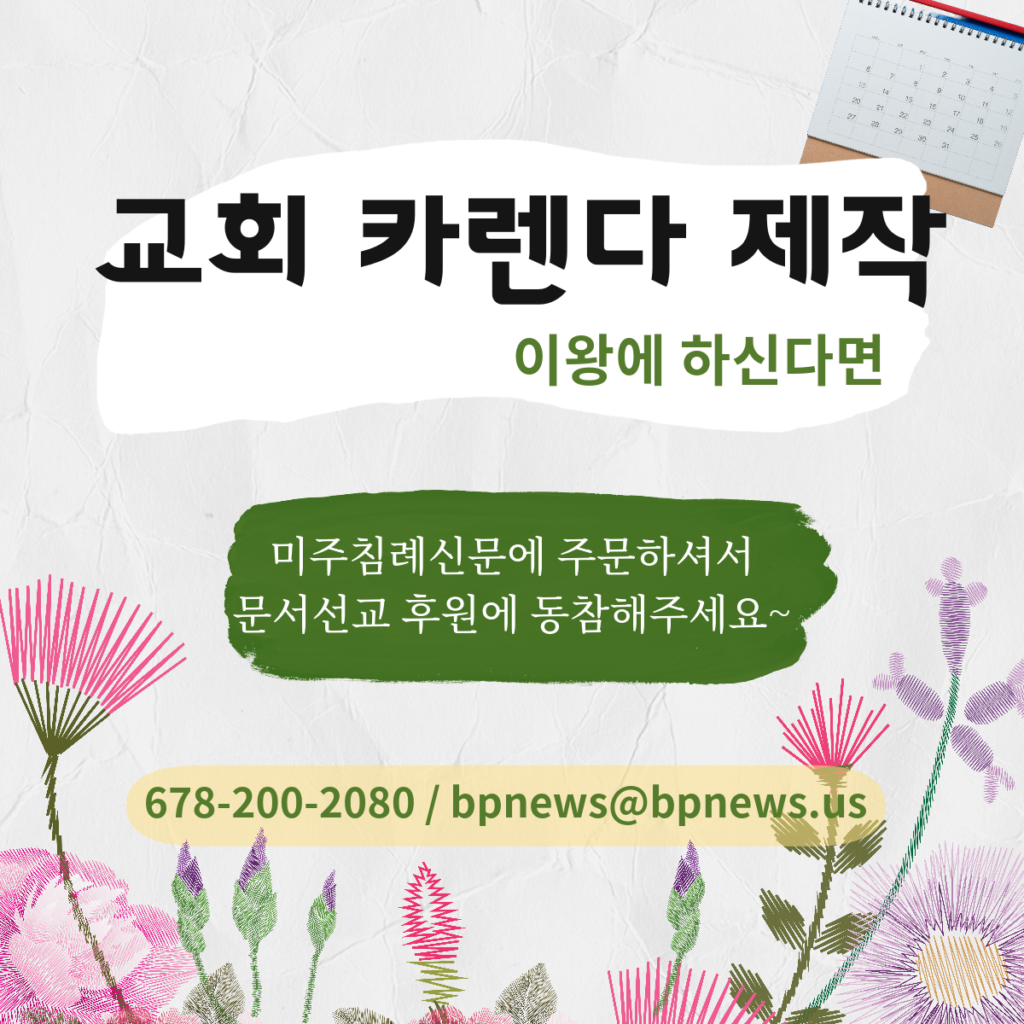
![[특집] “10 비전으로 죽은 교회가 살아난다” – 2025 목회 리더십 연례모임 성료](https://bpnews.us/wp-content/uploads/2025/04/ResizedIMG_9244-복사-65x65.jpg)
![[특집] “선교를 가져왔다” – 실리콘밸리에 선포된 하나님 마음](https://bpnews.us/wp-content/uploads/2025/04/ResizedIMG_8036-65x65.jpg)


![[특집] “애벌레가 나비 되듯, 약함이 강함으로” 제11회 전국 사모수양회… 80여 사모 회복과 은혜 체험](https://bpnews.us/wp-content/uploads/2024/12/Resized사본-4568-65x65.jpg)
![[특집 인터뷰] 게이트웨이 신임총장 Dr. Adam Groza](https://bpnews.us/wp-content/uploads/2025/02/Dr-Adam-Groza-65x65.webp)
![[긴급기도] 최악의 LA 산불 피해 속 남가주지방회장 서종학 목사 “많은 기도 부탁”](https://bpnews.us/wp-content/uploads/2025/01/Screenshot-2025-01-17-080455-65x65.png)
![[인터뷰] “하버드생들과 밤새 게임·성경공부”… 부모 마음으로 제자양육](https://bpnews.us/wp-content/uploads/2025/01/이금하교목-65x6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