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지미 사모의 사모의 뜨락]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송지미 사모의 사모의 뜨락] </br></br>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17/11/Web_%EC%86%A1%EC%A7%80%EB%AF%B8.jpg?resize=130%2C167&ssl=1)
“아~~~ 악!!!!!”
거의 기절한 저는 꺼져가는 촛불이 마지막 불꽃을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처럼 비몽사몽 간에 소리쳤습니다.
“성은 민! 이름은 달팽! 나는 너와 더 이상 한 지붕 아래 살 수 없어~~~!!!!!!!!!!!!!”
제법 시원해진 가을밤 공기를 흐뭇이 느끼며 남편과 동네를 걷다가 발밑에서 발견한 거뭇한 낙엽의 모양 때문에 문득 한 여름날 땡볕이 아직 완연하던 날 밤의 섬찟한 기억이 스쳤습니다.
그날은 더위를 먹은 것인지 알 수 없게 하루 종일 힘없이 흐느적거리다가 오랜만에 가족들과 전화통화를 하며 위로를 얻고 다시 힘을 얻어 가뿐한 마음으로 밖에 나가니 이미 밤늦은 시각이었습니다. 남편은 방학이 다 끝나기 전 작은 아이들과 출타 중이었고, 저는 큰 아이들과 밖에 나가서 시간을 보내고 이젠 오랜만에 맛보는 흐뭇하고 한적한 시간을 혼자서 즐기고 싶어졌습니다.
조금은 비를 머금은 듯한 바람이 불어오고, 저는 그 바람을 느끼며 한들한들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구름이 많이 끼어 있는 하늘은 아주 늦은 밤인데도 백야인 듯이 밝았습니다. 하늘은 하얀 솜이불 사이에 구멍을 내놓은 것 같이 드문드문 청아한 얼굴을 내밀었고 그 와중에도 커다란 달님은 구멍 난 하늘 틈새로 달빛을 쏘아 보내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밤이었습니다. 마음도 여유롭고 오랜만에 만나는 늦은 밤과의 대화는 그저 달콤하기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잠깐 사이에 고요하던 대기는 콩딱 콩딱 소리로 가득 찼고 저는 그것이 변덕스런 여름 밤하늘이 난데없이 생각보다 굵은 빗줄기로 양철 지붕을 때리며 내는 소리라는 것을 잠시 후에야 알았습니다.
조금 아쉽지만 드넓은 하늘 아래 더 이상 서 있지 못하고 덧댄 처마 밑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아야 했습니다. 이젠 조각하늘을 바라보며 커다란 그림자처럼 하늘을 배경으로 서 있는 나무와 아직도 그것들을 깨우려 흔들어대는 바람의 장난스러움을 바라보는 것으로 위안을 삼았지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은 언제나 어려워도 늦게까지 깨어있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저에게는 이 밤의 정적이나, 바람이나, 휘영청 밝은 달빛이나 모든 것이 아름답기만 했습니다. 단지 잠깐씩 제 귓가를 맴돌며 웽웽거리는 모기를 한 번 때려잡으려다가 그만 제 귀가 대신 귓방망이라는 대가를 치렀지만 말입니다.
아, 삶은 아름다워라… 맴맴 도는 생각들이 노래가 되어 나오고 하루 종일 무거웠던 몸과 마음을 누르던 일과들이 정리가 되면서 마음은 더없이 즐거웠습니다. 이젠 조금 눈을 부쳐야 다음 날 (이미 오늘이 되어 버린)을 무리 없이 견뎌내리라 생각하며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신발을 벗고 불 꺼진 부엌문을 열고는 마지막 발자국을 옮겼습니다. 사단은 바로 그때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아악~~~!!!!”
물~~컹….
으그…저는 물컹한 어떤 피조물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혀! 절.대.사.절!!! Never, Ever!!!!!
그러나 그 일은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그 완.벽.한. 밤.에 말입니다. 미끈덩…
‘하나님, 너무 가혹하십니다… 어찌 제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신단 말입니까….???’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곧 알았습니다. 이 밤에 두 아이와 출타 중인 우리 남편이 원망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전날 밤에 뒷마당에 나갔다가 어슴푸레한 속에서 뭔가 덩어리 같은 것들이 바닥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웬 개똥이야. 아니, 고양이 똥인가?’
우리 이웃에 그냥 돌아다니는 개는 본 적이 없지만 고양이는 가끔씩 돌아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검고 긴 것이 대여섯 개쯤 한 군데에 있어서 웬일인가 들여다보니 뜬금없는 견변도 묘변도 아니었습니다. 사람 손가락 굵기만 한 민달팽이님들이었습니다. 몸을 찌르르 훑어내리며 소름이 좌악 돋았습니다.
남편이 손수 닭을 길러 영양만점의 달걀을 먹자는 취지에서 기르기 시작한 병아리들이 이제 중닭이 되자 사료 값도 만만치 않다며 사다 놓은 사료 옆에서 아마도 바람을 쐬러 나왔던 민씨 일가족이 갑자기 별미를 맛보게 된 것 같았습니다. 물론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겸손히 청소하고 있는 중이었지만 말입니다.
아, 이를 어쩌란 말입니까? 나는 미안하지만 그 아이들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날은 남편에게 사료를 흘리지 않도록 당부했었습니다. 그런 이후엔 그 시간에 나가지 않았었으니 오늘의 이런 사태가 발발하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끔찍한 기분을 발바닥에 그대로 묻힌 채 저는 거의 기절할 지경으로 안으로 들어가 미끈미끈, 찐덕찐덕한 점액을 닦아 내야만 했습니다.
아직도 돋은 소름이 진정되지 않았지만 갑자기 저의 감각이 거기서 딱 멈추어 버렸습니다. 저는 그 느낌과 지저분하다고 생각되는 그 점액만 제거하면 됐지만 제 몸무게에 눌렸을 그 민씨 가족 중 하나는 생명이 갈리는 위기에 처했을 거라는 데 생각이 미쳤습니다.
‘에그머니나….’
이를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제가 한 지붕 아래 결코 살 수 없다고 소리친 그 아이는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을 텐데요… 어쩌면 그 일가족이 모여 그의 시신을 끌어안고 울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다음 날의 태양은 떠올랐고 걱정이 된 저는 일어나자마자 뒤뜰 부엌문 앞 사건 현장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민 달팽! 너 부상을 입고 쓰러져 있니? 말 좀 해봐… 아니면 가족들이 그 아이를 간호하기 위해 나뭇잎에 물을 담아 나르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거기, 그 사건 현장…… 거기엔 주인집 송씨 아줌마를 그렇게나 걱정시키고 그녀의 무게에 눌려 압사하신 민 달팽 둘째 아드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림자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휴우~~~~~!!!!’
가슴을 쓸어내리며 송씨 아줌마는 다시는 그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닭 사료는 창고 구석으로 옮기고 혹시나 남아 있을지 모르는 부스러기조차 깨끗이 치우기 위해, 화재의 현장을 진압하는 일등 소방관처럼 아주 열심히, 열정적으로 수도 호스를 힘껏 휘두르며 뒤뜰을 시원스레 물청소했습니다. 쏴아, 쏴아아~~~~~~~!!!!!!!!


![[특집] “10 비전으로 죽은 교회가 살아난다” – 2025 목회 리더십 연례모임 성료](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5/04/ResizedIMG_9244-%EB%B3%B5%EC%82%AC.jpg?resize=440%2C264&ssl=1)
![[특집] “선교를 가져왔다” – 실리콘밸리에 선포된 하나님 마음](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5/04/ResizedIMG_8036.jpg?resize=440%2C264&ssl=1)




![[박인화.박금님 선교사 부부의 하.우. 남아공 행전] (4) 왜 아직도 기분이 좋을까?](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5/04/Copy-of%EB%B0%95%EC%9D%B8%ED%99%94-%EB%B0%95%EA%B8%88%EB%8B%98-%EB%B6%80%EB%B6%802.jpg?resize=440%2C264&ssl=1)
![[박인화.박금님 선교사 부부의 하.우. 남아공 행전] (3) 무엇인들 못할까?](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5/04/Copy-of%EB%B0%95%EC%9D%B8%ED%99%94-%EB%B0%95%EA%B8%88%EB%8B%98-%EB%B6%80%EB%B6%802.jpg?resize=150%2C150&ssl=1)





![[권석균 목사의 설교이야기] 바울의 설교에 나타난 청중과의 소통 (7)](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0/07/web-%EA%B6%8C%EC%84%9D%EA%B7%A0-%EB%AA%A9%EC%82%AC%EB%8B%98.png?resize=440%2C264&ssl=1)
![[이수관 목사의 목회의 길에서] “할아버지가 된다는 것”](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0/08/%EC%9D%B4%EC%88%98%EA%B4%80-%EB%AA%A9%EC%82%AC%EB%8B%98-web.png?resize=440%2C264&ssl=1)
![[박성근 목사의 신앙 & 삶] 말하기 전에 THINK 하라](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0/08/%EB%B0%95%EC%84%B1%EA%B7%BC-web.png?resize=150%2C150&ssl=1)
![[손경일 목사의 세상에서 말씀 찾기] 종교적 에고를 넘어 한 영혼을 향한 부흥으로](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1/11/web-%EC%86%90%EA%B2%BD%EC%9D%BC-%EB%AA%A9%EC%82%AC%EB%8B%98.jpg?resize=150%2C150&ssl=1)
![[미드웨스턴 칼럼-안지영]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2)](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0/08/%EC%95%88%EC%A7%80%EC%98%81%EA%B5%90%EC%88%98-web.png?resize=150%2C150&ssl=1)
![[한국 글로벌선진학교] 개교 20년 만에 세계적 명문학교로 발돋움](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4/02/a61e2c74894ad39fec2cfbf4deb60bab_4mRP7Q2e_64a8f42de92f62b64bd4b54666a72c70ce0a6d42.jpg?resize=440%2C264&ssl=1)
![에스더 사모의 [진리와 하나된 교육] – 20 “교실에서 회복되는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배움의 자리”](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3/08/%EB%B0%95%EB%AF%BC%ED%9D%AC-%EC%82%AC%EB%AA%A8.jpg?resize=440%2C264&ssl=1)
![에스더 사모의 [진리와 하나된 교육] – 19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3/08/%EB%B0%95%EB%AF%BC%ED%9D%AC-%EC%82%AC%EB%AA%A8.jpg?resize=150%2C150&ssl=1)
![[특집 인터뷰] 게이트웨이 신임총장 Dr. Adam Groza](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5/02/Dr-Adam-Groza.webp?resize=150%2C150&ssl=1)
![[강태광 목사의 문학의 숲에서 만나는 진리의 오솔길] C. S. 루이스의 작품 산책(4) 순전한 기독교 내용 정리](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0/08/%EA%B0%95%ED%83%9C%EA%B4%91-web.png?resize=440%2C264&ssl=1)


![[김웅의 성경만화] 기뻐하는 세 집사: 누가 편](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3/12/%EA%B9%80%EC%9B%85-%EB%AA%A9%EC%82%AC%EB%8B%98-scaled.jpg?resize=150%2C150&ssl=1)




![[시론 時論] 선지자적 음성을 회복하라](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3/09/%EC%98%A8%EB%9D%BC%EC%9D%B8%EB%8F%84-%EB%B3%80%EA%B2%BD-Dr-Sam-Lee.jpg?resize=388%2C264&ssl=1)
![[사설 社說] AI와 목회 환경의 변화: 우리의 준비가 시급하다](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1/04/%EC%82%AC%EC%84%A4.png?resize=150%2C150&ssl=1)








![[다가오는 총회 소개 영상] ③ [인터뷰] 주강사 박성근 목사](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4/05/thum3-re.png?resize=440%2C264&ssl=1)
![[다가오는 총회 소개 영상] ② 정기 총회 장소를 미리 보시죠](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4/05/Slide1-1.jpg?resize=150%2C150&ssl=1)
![[다가오는 총회 소개 영상] ① 총회장 초청·환영 인사](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4/05/R-%EC%8D%B8%EB%84%A4%EC%9D%BC-%EC%B4%9D%ED%9A%8C%EC%9E%A5-%EC%B4%88%EB%8C%80-%EB%B0%8F-%ED%99%98%EC%98%81.jpg?resize=150%2C150&ssl=1)

![[사설 社說] 생존율 1%의 개척교회, 90%의 소형교회 위해 목회코칭, 그룹별 온라인 네트워크를 갖추자](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17/09/%EC%82%AC%EC%84%A4.jpg?resize=161%2C171&ssl=1)


![[권석균 목사의 설교이야기] 바울의 설교에 나타난 청중과의 소통 (7)](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0/07/web-%EA%B6%8C%EC%84%9D%EA%B7%A0-%EB%AA%A9%EC%82%AC%EB%8B%98.png?resize=150%2C150&ssl=1)

![[특집] “10 비전으로 죽은 교회가 살아난다” – 2025 목회 리더십 연례모임 성료](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5/04/ResizedIMG_9244-%EB%B3%B5%EC%82%AC.jpg?resize=150%2C150&ssl=1)
![[한국 글로벌선진학교] 개교 20년 만에 세계적 명문학교로 발돋움](https://i0.wp.com/bpnews.us/wp-content/uploads/2024/02/a61e2c74894ad39fec2cfbf4deb60bab_4mRP7Q2e_64a8f42de92f62b64bd4b54666a72c70ce0a6d42.jpg?resize=150%2C150&ssl=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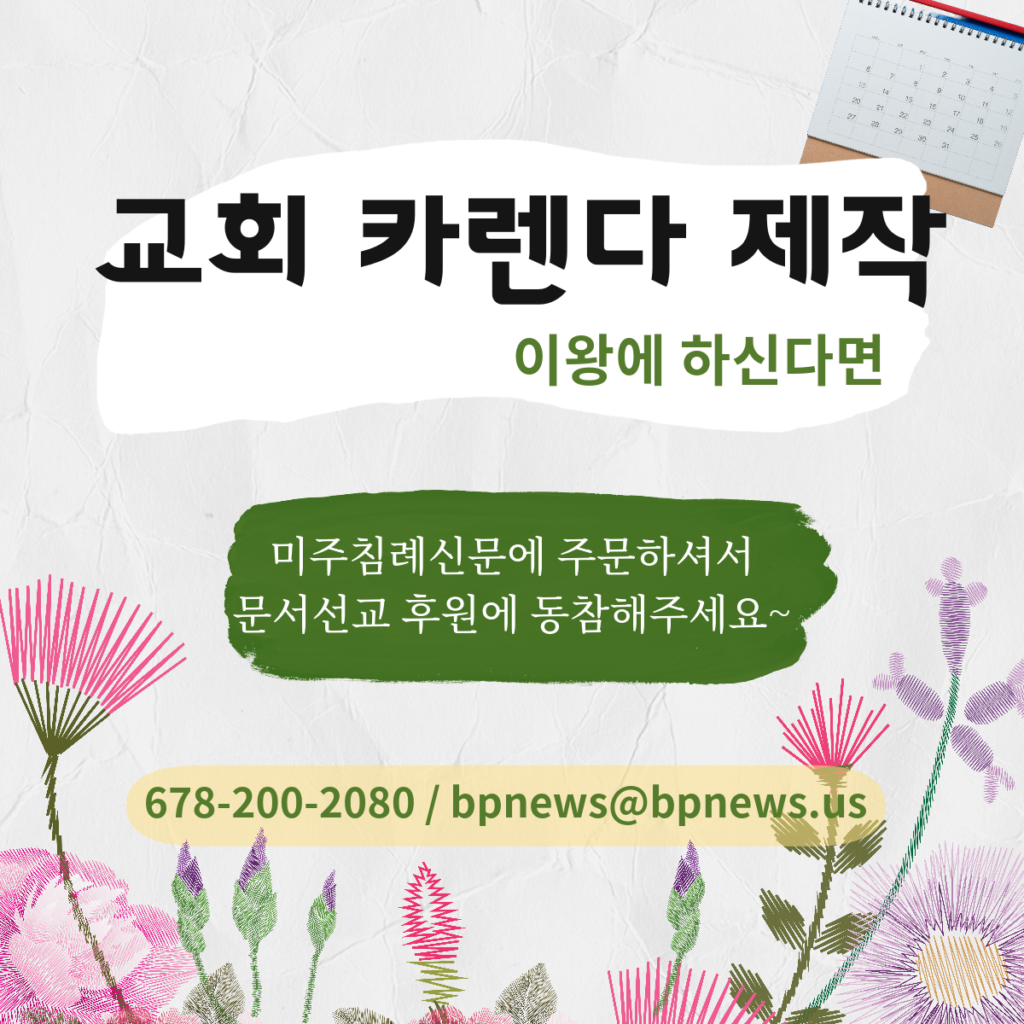
![[특집] “10 비전으로 죽은 교회가 살아난다” – 2025 목회 리더십 연례모임 성료](https://bpnews.us/wp-content/uploads/2025/04/ResizedIMG_9244-복사-65x65.jpg)
![[특집] “선교를 가져왔다” – 실리콘밸리에 선포된 하나님 마음](https://bpnews.us/wp-content/uploads/2025/04/ResizedIMG_8036-65x65.jpg)


![[특집] “애벌레가 나비 되듯, 약함이 강함으로” 제11회 전국 사모수양회… 80여 사모 회복과 은혜 체험](https://bpnews.us/wp-content/uploads/2024/12/Resized사본-4568-65x65.jpg)
![[특집 인터뷰] 게이트웨이 신임총장 Dr. Adam Groza](https://bpnews.us/wp-content/uploads/2025/02/Dr-Adam-Groza-65x65.webp)
![[긴급기도] 최악의 LA 산불 피해 속 남가주지방회장 서종학 목사 “많은 기도 부탁”](https://bpnews.us/wp-content/uploads/2025/01/Screenshot-2025-01-17-080455-65x65.png)
![[인터뷰] “하버드생들과 밤새 게임·성경공부”… 부모 마음으로 제자양육](https://bpnews.us/wp-content/uploads/2025/01/이금하교목-65x65.jpg)


